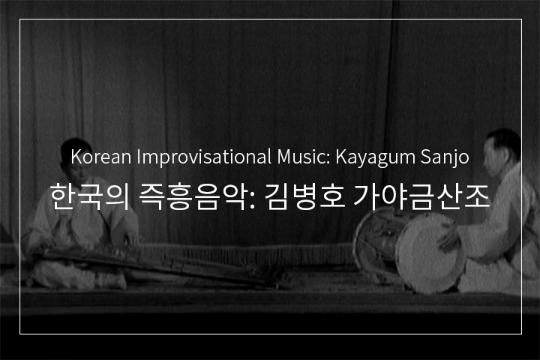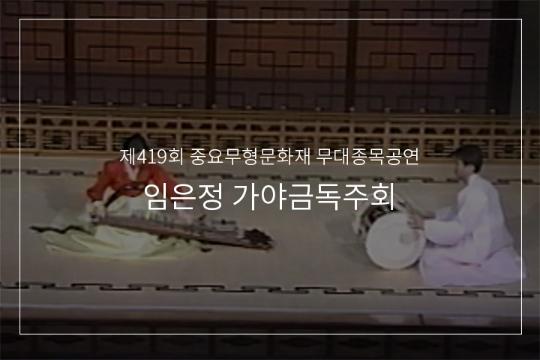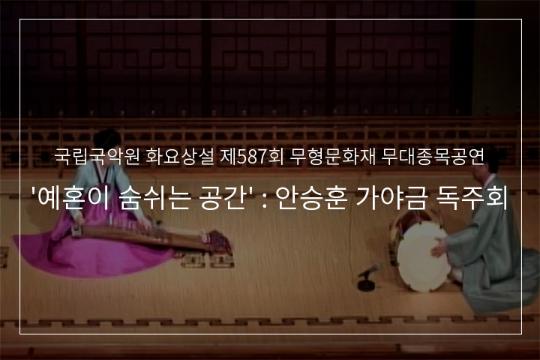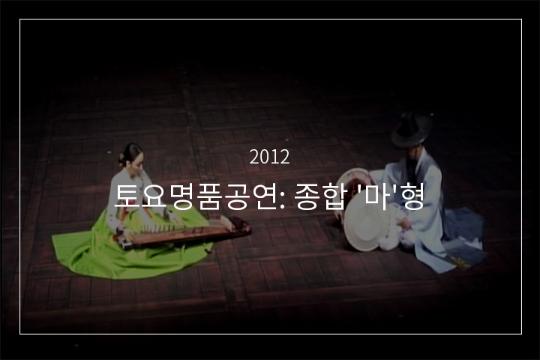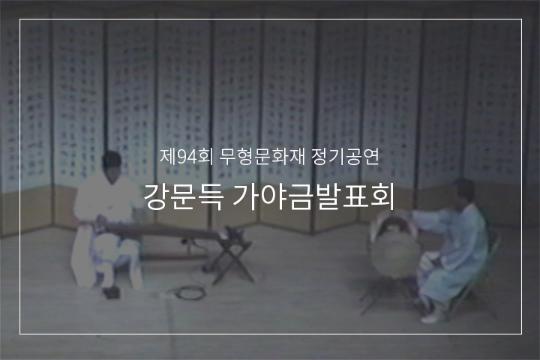-
다른 이름
김병호 가야금산조, 김병호 산조
-
정의
김병호 명인이 구성한 가야금산조
-
요약
-
유래
김병호의 호는 금암(錦岩)이며 1910년 11월 5일 전라남도 영암(본관 김해)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창극단 단원(1937-1939), 임방울창극단 단원(1940-1941), 동래권번 교사(1942-1946), 임춘앵국극단 악사(1951-1953), 인천여고 고전음악 강사(1959-1961), 국립국악원 전임악사(1961-1963), 국립국악원 장악과 연주원(1963-1968)을 역임하였다. 1968년 8월 31일 지병으로 타계하였으며 유택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용미리 공원묘지이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창조(金昌祖, 1865~1918)의 계보를 잇는 산조로 김병호는 6세부터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사사하였으며 아쟁, 단소연주에도 능했다.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김병호는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사사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짰으며, 그의 산조는 강문득 · 양연섭 등에게 이어졌다. 강문득의 제자로는 선영숙, 김남순 등이 있으며 양연섭의 제자로는 안승훈, 이지영 등이 있다.

< 1966년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미상의 일시에 미상의 장소에서 촬영한 '김병호'의 이미지 자료이다. ©국립국악원 >
○ 음악적 특징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장단구성은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엇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단모리이다. 특히 진양조에서 2분박이 나타나고 중모리에서 3분박이 나타나며 가야금산조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엇모리 장단이 쓰여 다양한 리듬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이하게 자진모리 푸는 대목에서 하모닉스 연주법(일명 귀곡성, 鬼哭聲) 연주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병호류 산조의 시김새는 다른 산조에 비해 매우 섬세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진양조 우조에서 매우 복합적이며 미세한 미분음이 나타나면서 매우 섬세한 연주가 필요하다. 관절과 손목을 쓰는 색다른 농현법과 미세한 미분음 연주에 많은 기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주자들 사이에 연주하기 매우 어려운 산조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줄 잘 뜯기는 대봉이요, 줄 잘 이기기는 금암이다’ 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김병호는 산조의 농현에 능하여 독특한 맛이 났다고 한다. 김병호의 호는 금암(錦岩)인데, 이는 김병호는 성음이 바위와 같이 단단하고 옹골찬 소리가 비단처럼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기에 이런 호가 지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 1966년으로 추정되는 해의 미상의 일시에 미상의 장소에서 촬영한 '김병호'의 이미지 자료이다. ©국립국악원 >
○ 악기편성 가야금산조는 가야금독주에 장구반주로 연주된다.
-
의의 및 가치
가야금산조는 19세기 말에 전라남도 영암출신인 김창조가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가야금산조는 지역에 따라 전남제,전북제, 충청제로 나뉘어지는데 김병호는 전남제인 김창조와 동향(同鄕)이며 또한 직속 제자로, 김창조의 계통을 바로 잇는 산조라 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약 35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가야금이 낼 수 있는 미세한 여음연주와 단단한 소리성음, 잘 짜여진 조구성으로 산조가 갖추어야 할 음악적 구성을 잘 갖춘 명산조라는 평을 받는다.
< 1967년 녹음. 1998년 6월 제작.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춘자 > -
지정사항
강문득에게 사사한 선영숙이 200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에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7,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1987. 김남순, 『금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교본』,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1. 김인제·선영숙,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14. 김시연, 「김병호 가야금산조의 발전과정 연구 : 전승자별 가락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45, 2022. 김형섭, 「김병호의 산조 다스름과 허튼가락 연구 : 로버트 가피아스 소장자료에 기하여」, 『국악원논문집』 41, 2020. 양연섭,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20. 최미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 『한국음악문화연구』 9, 2016. 황병주, 「가야금산조의 꼼꼼한 안내서 :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한국음악학사학보』 17, 1996.
-
집필자
이지영(李知玲)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