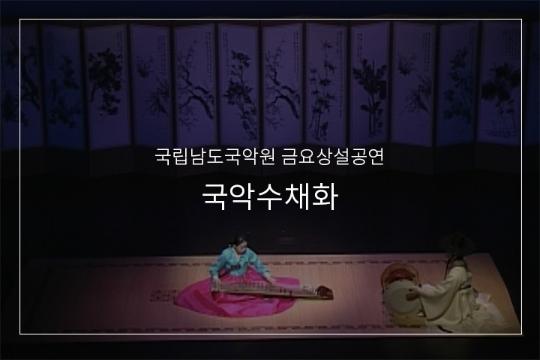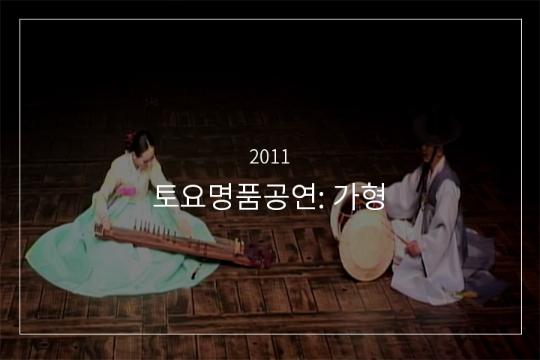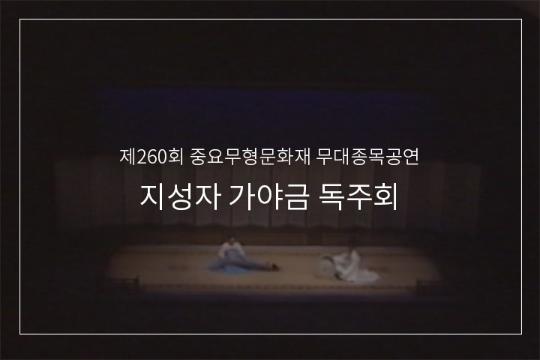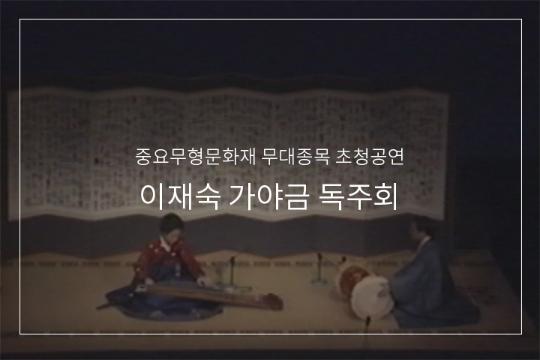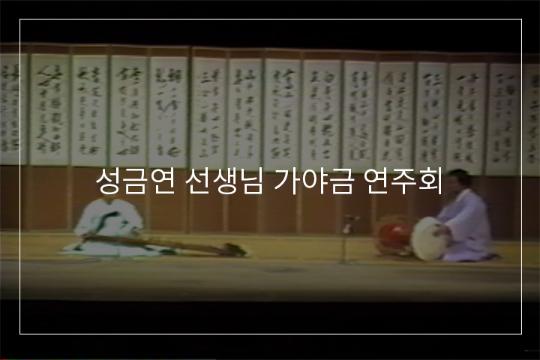-
다른 이름
성금연 가야금산조
-
정의
성금연이 안기옥으로부터 음악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이 만든 선율을 추가하여 창작한 가야금산조
-
요약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박상근 및 안기옥의 산조를 바탕으로 하여 성금연(成錦鳶, 1923~1986)이 자신을 가락으로 자신의 만년까지 끊임없이 새로 만들고 다듬어 완성되었다.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성금연은 1923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으며, 풍류를 좋아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 국악에 입문하여 가야금을 비롯한 여러 악기와 판소리, 가야금병창을 두루 배웠다. 가야금산조는 최옥산(崔玉山; 옥삼(玉三), 1905~1956), 안기옥(安基玉, 1894~1974), 조명수(曺明洙, 1907~1937) 박상근(朴相根, 1905~1949) 등에게 배웠고 이후로 많은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말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산조를 다듬고 정리하였다.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1950년대에 진양조부터 휘모리까지의 구성으로 연주시간이 12분 정도였다가 1970년대 이후 다스름과 엇모리 악장이 추가되고 중중모리를 제외한 전 악장에 많은 선율이 추가되면서 70분이 넘는 대곡으로 완성되었다.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성금연)-연주모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
특히 말년에 이르러 계면조 선율이 대폭 추가되었고 전반적으로 평조 선율이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현재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로 정립되어 지성자, 지순자를 비롯한 여러 후손들과 제자들이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

< 성금연 가야금 독주회 프로그램북 표지(국립극장, 1967년)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
○ 음악적 특징 성금연은 만년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산조를 창작하고 재구성했기 때문에 각 이본에 따라 음악의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악장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황병주의 『가야금교본』(2017)에 의하면 성금년 초기 산조와 만년의 산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후자는 성금연이 1981에 발표한 50분 분량의 음악이다. 황병주의 『가야금교본』(2017)에 의하면,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금 산조에 굿거리 악장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며 최종 악장이 엇모리인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그러나 엇모리 악장은 모두 4장단에 불과해 악곡의 최종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황병주의 『가야금교본』(2017)에 의하면 각 악장 마다 조(調의) 전개 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면 진양조에서는 우조-평조-계면조로, 중모리에서는 계면조-경조-계면조, 중중모리에서는 계면조-평조로, 굿거리에서는 계면조-평조-변계면으로, 자진모리에서는 계면조-변계면-계면조로, 휘모리에서는 계면조-우조-변계면-계면조로, 엇모리에서는 계면조로 되어 있다.
< 금연류 가야금산조(지성자) ⓒ국악방송 > -
의의 및 가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산조가 지닌 이야기의 속성을 음악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조를 흔히 ‘말없는 판소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판소리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인 동시에 판소리처럼 서사적 이야기를 기악으로 풀어낸다는 뜻도 지닌다. 성금연류 산조는 거의 모든 악장에서 문답형식의 선율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조 틀 안에서 선율이 서로 연결되어 흘러가는 형식 구조는 마치 소설과 같이 서사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과 같아 ‘말없는 판소리’로서 산조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
지정사항
국가무형유산(1968-1975),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2010)
-
참고문헌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7 : 산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윤중강·정현경 엮음, 『그리운 성금연: 춘사 성금연 자료집』, 민속원, 2003. 황병주, 『가야금교본』 서울: 은하출판사, 2017, 21판(1984 초판) 김일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변천 및 교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보경,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형성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집필자
김일륜(金日輪)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