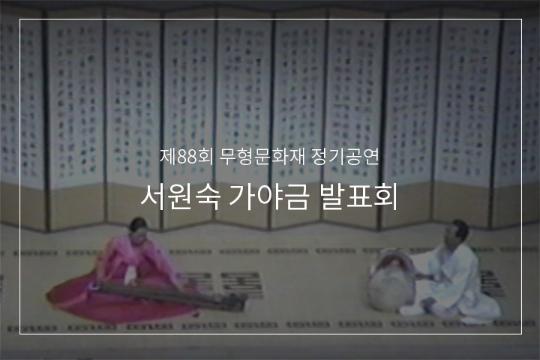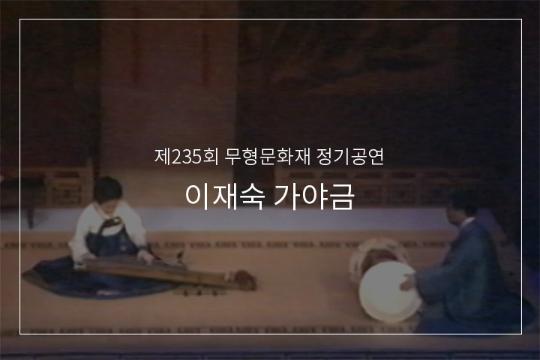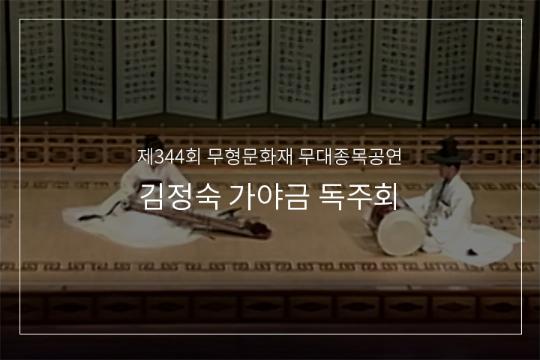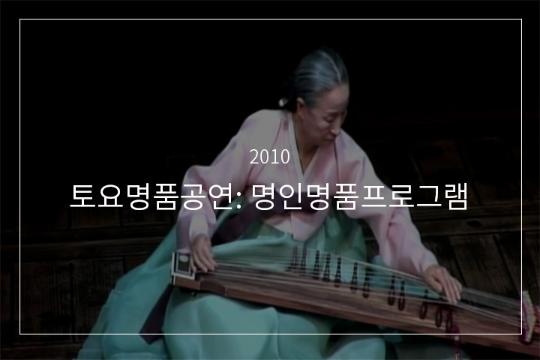-
정의
가야금산조의 한 유파로 제3세대 가야금산조 명인인 김윤덕(金允德, 1918~1978)이 정남희(丁 南希, 1905~1984) 가락에 바탕하여 강태홍(姜太弘, 1892~1968) 과 본인가락을 넣어서 만든 기악독주곡
-
요약
본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구성되어 여느 산조와 다르지 않으며, 여기의 휘모리는 자진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휘모리와 같은 악장이다. 그의 직접 스승인 정남희와 강태홍, 그리고 본인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양조에서는 특히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와 공통된 가락이 많이 나오고 네 장단씩으로 단락 지어진 점이나 부가리듬 형태로 진양조의 선율이 엮이는 점 등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특징과 공통적이다. 또 단모리의 후반에서는 장단 틀을 비껴가는 장단 엮음이 적극적으로 펼쳐져 본 산조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
유래
김윤덕은 본 가야금산조의 계보를 한숙구(韓淑求, 1849~1934)와 그의 아들 한수동(韓壽同, 1 902~1929)을 거쳐 한성기(韓成基, 1889~1950), 안기옥(安基玉, 1894~1974), 정남희(丁南希, 1905~1984)로부터 본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계보대로라면 본 산조는 한숙구의 계열로 분류하게 된다. 그런데 한수동은 한성기보다 연하이고 요절했기 때문에 한수동을 통해서 한숙구의 음악이 한성기에게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나이의 여건상 한성기는 한숙구에게 배웠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편 김윤덕의 직접 스승인 정남희가 어려서 한덕만(韓德萬, 1867~1934)한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덕만은 정남희의 외가이면서 한숙구와 친척간이기도 하다. 또한 한숙구와 김창조도 멀지 않은 친척 간이라고 하므로 산조가락의 형성에서 두 집안 간의 음악적 공유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한편 한성기와 안기옥은 김창조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한성기는 광복 이후 일찍 작고했고 안기옥은 월북했으므로 남한음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웠다. 또 정남희는 안기옥의 제자이며 월북해서 함께 활동했다. 김윤덕은 1947년 정남희에게 47분가량의 산조 한바탕을 배웠고, 1950년대 피난 시절 부산에서 강태홍에게도 배웠다. 결국 김윤덕 가락 안에는 강태홍과 정남희, 김윤덕의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2세대 연주자인 강태홍과 안기옥, 안기옥과 그의 제자 정남희, 또 강태홍과 정남희의 음악적 교류 또는 공유, 김윤덕 만의 창의적 가락 등, 2-3세대에 걸친 음악적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김윤덕은 정남희 가락을 “잎사귀보다 가지, 가지보다 줄기, 줄기보다 뿌리가 실한 산조”라고 스스로 평하며 그 산조의 음악적 깊이를 전하고자 하였다.
-
내용
〇 음악적 특징
본 산조에 대해서 진양조장단은 조금 세세하게 언급하고 나머지 장단은 특징적인 점만 짚어가고자 한다. 진양조는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로 짜여 있어서 선율 틀 면에서 여느 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양조: 우조대목은 a 본청과 e′본청으로 5도 간격의 계면길로 짜이며, 임시적 조바꿈을 쓰는 방법도 여느 산조와 같다. 돌장 또한 우조대목의 장2도 아랫 조로 내려와 평조길로 선율이 바뀌며, 종지선율은 계면길로 마무리된다. 또 평조대목은 평조길로 시작해서 종지구는 계면조로 마무리된다. 계면조대목은 유파마다 가장 다양한 선율들이 나타나는데, 본 산조는 5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면조대목에서 특별한 청 바뀜이나 조바꿈이 쓰이지 않고 g본청 계면길로 일관된다. 진양조의 전체적인 선율진행 구도는 여느 산조와 다르지 않으나 계면조 대목에서 청 바뀜이 없는 점은 이례적이다.
본 산조 진양조에 나타나는 김윤덕 가락 짜임의 특징을 다른 류와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진양조 한 장단을 24박으로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6박씩 4장단으로 선율단락이 이루어진다. 강태홍류 진양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는 앞 대목에서만 그렇고 끝까지 지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 곡은 진양조 선율전체가 4장단씩으로 단락 지어 있어서 김윤덕은 진양조를 24박에 맞추고자 한 것 같다.
두 번째는 각 단락에서 종지 가락은 대부분 두 장단씩으로 종지구를 이루고 있어서 종지 단락이 매우 강조된다. 이는 심상건 류에서도 “긴 종지구”로 드러나 선율형식 역할을 하였는데, 심상건류에서는 짧은 종지구 선율도 자주 쓰여서 본 산조와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 큰 단락의 선율을 짜나가는 방식을 보면 첫 시작은 반복 선율을 활용하거나 장단의 끝을 장인하여 간결하고 한원하게 두어 장단을 만든 뒤, 단락의 중간 이후로는 리듬세분을 하거나 패시지를 복잡하게 만들어 단락의 시작과 전개 대목을 구분하였으며, 끝에는 긴 종지구를 붙인다. 매 단락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율 전개가 이루어져서 이를 김윤덕이 선율을 짜나가는 방식으로 보게 된다.
네 번째 엇박이나 당김음을 써서 선율리듬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장단 첫머리를 보내놓고 선율진행을 한다든지, 장단 틀과 어긋나게 선율을 짜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리듬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진양조 6박을 8분음표 18개로 본다면 3+4+2+3+3+3(9+9)/ 4+4+4+3+3(12+6)/ 4+5+4+5(9+9)/ 2+3+3+3+4+3+4(11+7)등으로 3박씩 반복되는 리듬구도를 피해가고 있다.
다섯째 종지를 일부러 피한 듯한 선율진행도 끝 대목에 나타난다.
여섯째 강태홍 가락과 공통된 진행이 진양조 전체에 걸쳐 있는데, 이는 정남희, 강태홍을 사사한 영향으로 보인다. 강태홍과 정남희, 김윤덕의 선율적 공통성과 밀접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모리: 중모리 장단은 모두 70장단으로 길이가 매우 긴 편이며, 계면조로 시작해서 경조, 평조, 계면조, 덜렁조로 짜여있다. 계면조대목이나 경조 대목은 4장단 단위로 짜여 있는데, 이 점은 진양조에 나타났던 4장단 단위와 공통된다.
중중모리: 중중모리 또한 84장단으로 여느 산조에 비해서 매우 긴 편이다, 특히 61-72장단에서 g음을 중심에 두고 f-b♭음 진행으로 소수의 음을 활용하면서 리듬 세분으로 가락을 엮어가는 방식은 매우 특징적이다.
자진모리: “계면조-우조, 계면조-평조, 계면조”로 단락이 짜여있어 단락구성의 형식감을 주고자 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첫 대목 4장단은 g음만으로 내드름 가락이 진행되어 굳이 계면조로 구분되기에는 무리함도 있다.
휘모리: 여느 산조의 자진(잦은) 자진모리 가락에 해당한다. 장단 단위에 맞추어 짧은 대구로 문답이 이어져서 선율진행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다.
단모리: 여느 산조의 휘모리 가락에 해당한다. 81-89장단 사이에서 지속되는 당김음 사용 즉장단 첫 박을 보내고 둘째 박에 시작하는 선율짜임은 본 산조의 특징을 보여준다.
<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공연 영상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연주:가야금/김정숙, 반주/김청만 ⓒ국립국악원 > -
의의 및 가치
김윤덕은 1947년 서울에서 정남희에게, 그리고 1950년 부산 피난시절에는 강태홍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운 뒤, 1960년 후반부터는 두 산조의 가락을 섞고 자신의 것을 삽입하여 김윤덕류를 만들었다고 하므로, 여기에는 김윤덕 외에 정남희, 강태홍의 음악적 영향과 특징이 들어가 있다. 한편 제 2세대 연주자인 강태홍의 짧은 산조와 그 후배인 정남희의 것이 공통되므로 본 산조의 계보는 강태홍 정남희 김윤덕으로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야금산조의 전승이 구전이고 유파마다 모방 표절 답습 등의 방법으로 세대 간 가락이 이어져 온 음악환경과 관습이 있지만, 김윤덕 본인의 창작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해숙, 「가야금산조의 유파별 비교」, 『산조연구』 , 세광출판사, 1987.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도서출판어울림, 1995. 김정숙,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향제』, 학민사, 2001. 이효분, 『가야금의 마음 :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이해』, 프레스 임프레스, 2022.
-
집필자
김해숙(金海淑)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