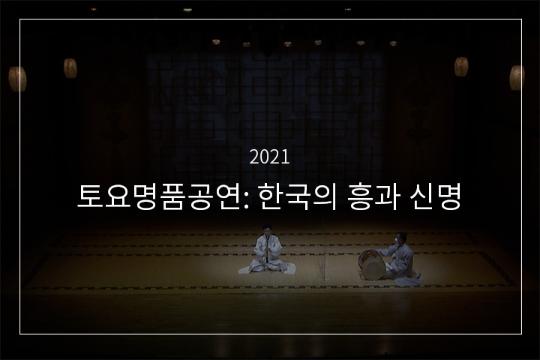-
다른 이름
퉁애산조
-
정의
퉁소(洞簫)로 연주하는 산조
-
요약
퉁소산조는 20세기 초반에 박종기, 전용선, 유동초, 편재준 등과 같은 명인들에 의해 민간에서 널리 연주되었다. 재는 한범수, 이생강 등이 맥을 잇고 있다.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퉁소는 주로 민속기악합주 및 독주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퉁소 연주가 줄어들면서 퉁소산조 전승이 활발하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송천근(宋千根), 유동초(柳東初, 1887~1946), 편재준(片在俊, 1914~1976), 한범수(韓範洙, 1911~1984) 등이 퉁소연주에 빼어났다고 전하지만 그 음악의 전승은 단절된 실정이다. 유동초의 산조 중모리가 유성기 음반((Victor Star KS-2007 )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동초의 퉁소산조는 1957년 한범수에 의해 재현된 바 있으며, 이생강 등 몇몇 소수에 의해 연주되고 있다. ○ 음악적 특징 이진원의 『퉁소연구』 (1990)에 의하면, 한범수에 의해 연주된 퉁소 산조에 두 가지 이본이 있다. 양자 모두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퉁소산조의 연주법은 단소산조 연주법과 동일한 제1공에서 제4공까지만 사용해서 연주하는 ‘세가락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기 구경이 크므로 격렬한 농음을 할 때는 머리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흔들어 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의의 및 가치
퉁소 산조는 퉁소가 대금과 함꼐 널리 연주될 무렵 만들어졌으나 퉁소라는 악기가 점차로 연주계에서 사라지면서 산조 역시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퉁소 산조의 음원은 산조사의 변화를 선명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 퉁소산조 ⓒ국립국악원 > -
참고문헌
이상규, 「단소와퉁소」, 『음악학논총』, 2000. 이진원, 「종취관악기의 전통적 주법 연구-퉁소와 단소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15, 1997. 이진원, 『퉁소연구』 진영문화사, 1990. 이보형, 「퉁소산조의 명인에 대한 고찰」, 『한국악기학』 6. 2009. 조석연, 「유동초 생애 재검토」, 『한국음악사학보』, 2010. 조석연, 「한국 퉁소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2014.
-
집필자
조석연(趙石娟)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