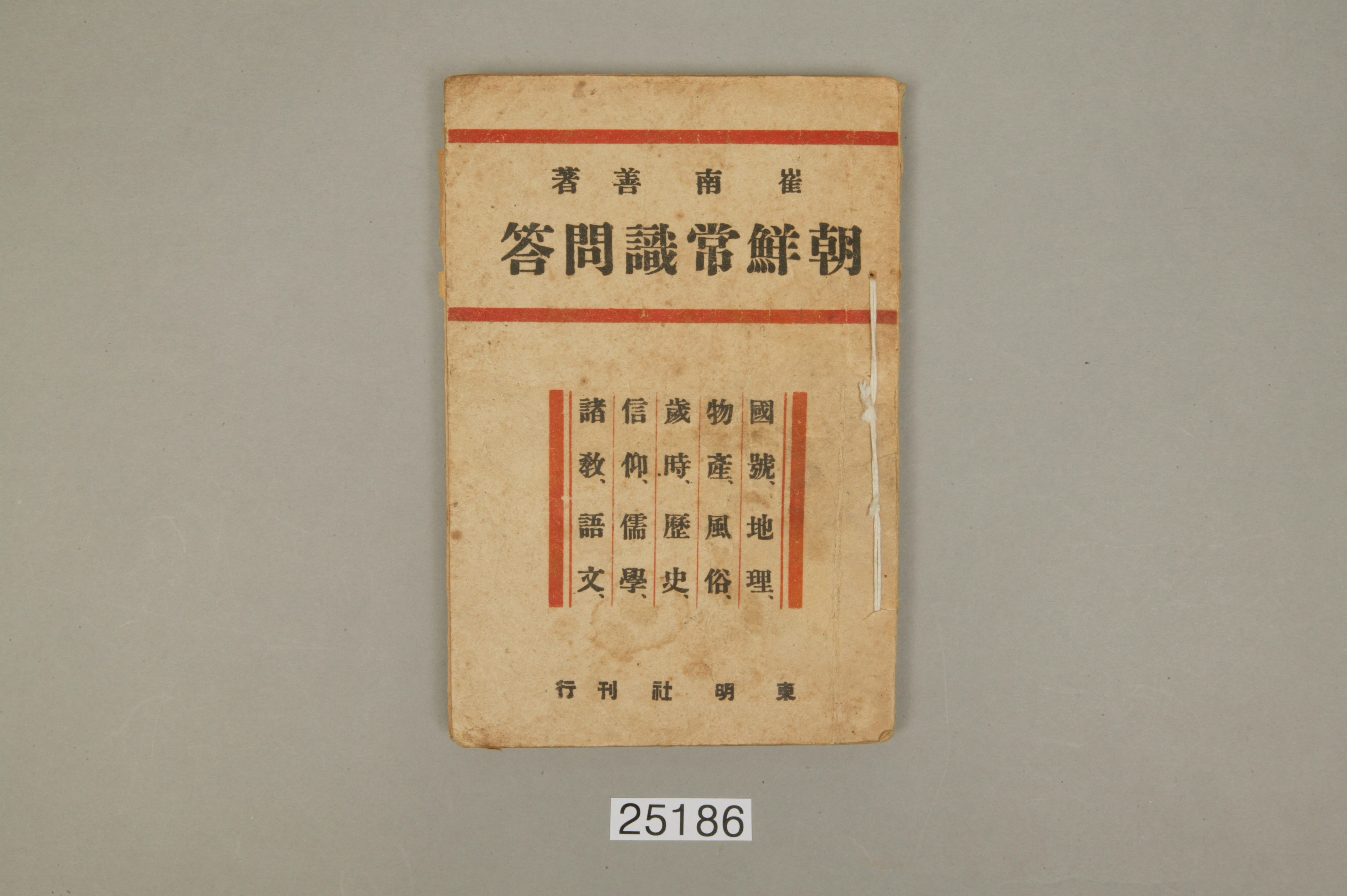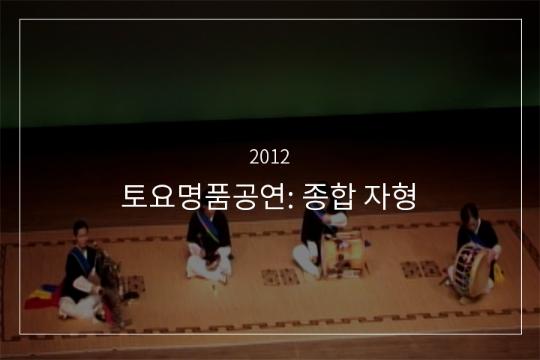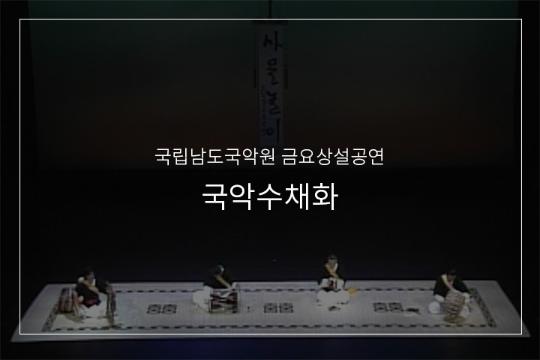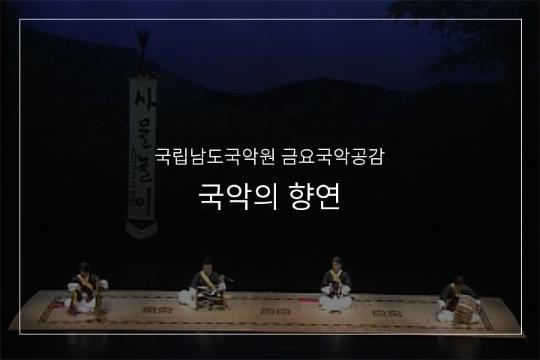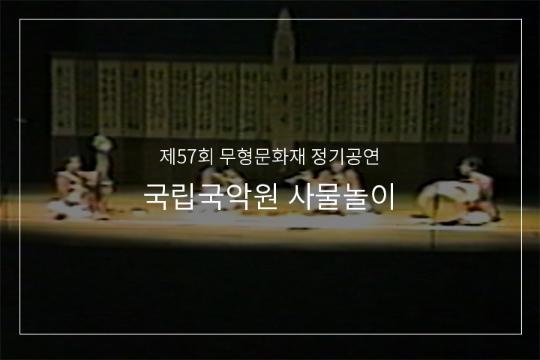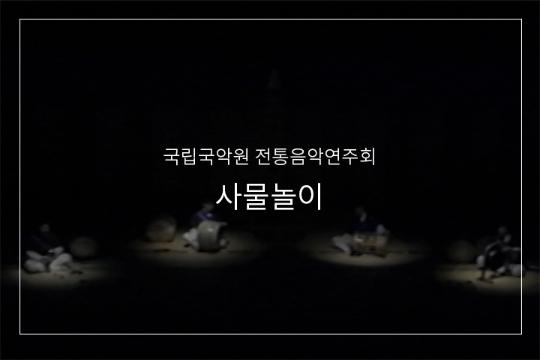-
다른 이름
경상도 농악, 매구, 매귀, 매귀굿 -
정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영남지방에서 전승되는 농악 -
요약
경북농악과 경남농악을 아우르는 경상도 지역의 농악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대구ㆍ달성ㆍ군위ㆍ안동ㆍ영덕ㆍ영천ㆍ청도ㆍ경산ㆍ예천ㆍ김천 등지의 경북 일대와 마산ㆍ진주ㆍ사천ㆍ밀양ㆍ창녕ㆍ부산ㆍ김해ㆍ통영ㆍ고성 등지의 경남 일대에 전승되는 농악이다.![[그림 1] 『농악』 19쪽 中 농악 주요분포지역](http://www.gugak.go.kr/ency/resource/media/2023/09/19/2934.png)
< 영남농악 주요 분포지역 ©정모희 > -
유래
농악의 유래에 대해서는 축원기원설, 군악기원설, 불교기원설 등의 학설이 있으나, 그 전개 과정이나 발전 과정을 구명할 길은 없다. 현존하는 농악을 개관해 보면, 위의 여러 기원설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형태가 농악에 남아서 분포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魏書 東夷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서는 항상 5월(月)로서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을 제사하는데 무리 지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며 날을 이어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뒤따르며 땅을 높게 낮게 굴리고, 손발이 상응한다. … 10월에 농사를 마쳤을 때도 또한 이것을 반복한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농경신(農耕神)에 대한 축원(祝願)의식에서 농악의 기원을 찾아 봄직하다. 그러나 당시의 축원 가무 의식 형태가 오늘날처럼 악기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춤을 위주로 장단을 맞추고 가장 원초적 악기로 보이는 북을 울리면서 사위를 지어 춤추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 작품에서는 벼베기를 마무리한 가운데 농악놀이로 일년농사를 축하하고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 > -
내용
영남농악은 같은 영남권이면서도 경상북도 농악과 경상남도의 농악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악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에 의해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가진다. 영남농악은 동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영동농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며, 서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호남좌도농악과 유사해진다. 따라서 경북농악은 비교적 영동농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북농악에서도 안동과 영주와 같은 동북지방의 농악은 영동농악의 특색이 짙고, 대구나 청도 지역은 비교적 경남농악에 가까우며, 김천ㆍ선산지방의 농악은 경기ㆍ충청농악과 비슷한 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남농악은 함양ㆍ진주ㆍ삼천포ㆍ마산ㆍ통영ㆍ고성 등지의 서남지방의 농악과 밀양ㆍ울산 등지의 동부지방 농악으로 가를 수가 있다. 또한 부산ㆍ양산ㆍ진해 등지의 농악은 중간 형태의 특징이 보인다. 경북 금릉군의 빗내농악은 완전한 군대의 진법을 모의(模擬) 군사굿이라 할만하고, 청도군의 차산농악은 순수한 모의 농사굿이라 볼 수 있다. 대구지역의 비산농악이나 고산농악은 축원굿에다 농사굿 형태의 판굿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신밟기의 기능도 한다. 욱수농악은 ‘외따먹기’와 ‘오방진’과 같은 모의 진법이 들어 있어 모의 군사굿의 요소가 두드러지고, 아울러 ‘질굿’은 군악의 행악을 방불케 하며, 지신밟기도 행하고 있다. 부산아미농악은 의례적인 축원의 형태로서 농사굿과 지신밟기가 복합되어 있고, 경남의 진주ㆍ삼천포농악은 군사굿의 진법 색채가 강하다. 이와 같이 영남의 농악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나타난다. 경상도에서는 농악을 ‘매구’, ‘매구친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매귀(埋鬼)’, ‘매귀(魅鬼)굿’이라고도 쓴다. 또, 경상북도의 동해안과 소백산맥 기슭을 따라 마을들의 수호신, 개척신을 ‘골매기’라고 하고, 동제 때 농악을 울리는 일을 ‘골매기 친다’라고도 한다. 대구광역시의 비산농악은 마을의 상당ㆍ중당ㆍ하당의 3당으로 된 동제당에 올리는 농악에 의한 동제를 ‘천왕메기굿’이라 하는데, 이 역시 천왕신인 골매기와 관계가 있다. 동제가 동신(洞神)인 ‘골매기’에 대한 진혼(鎭魂)을 한다하여 ‘매귀(埋鬼)’라는 한자로 표기되므로, ‘매구’는 곧 ‘골매기’와 관련지어서 해석될 수 있다. 경상도 농악의 쇠가락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흔히 길군악(질굿), 덧배기, 덩덕궁이(정적궁), 다드래기 등이 많이 쓰인다. 길군악은 대체로 혼합박자로 된 지역이 많으며, 덧배기와 덩덕궁이는 3소박 4박의 자진모리형 장단을 말한다. 덧배기는 지역에 따라 굿거리형의 느린 덧배기와 자진모리형의 빠른 덧배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드래기는 2소박 4박 혹은 3소박 4박의 휘모리형 장단으로 매우 빠르게 몰아치는 특징이 있다. 경상도 농악 가락은 한 가락만 내면 이것을 매우 빠르게 몰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잔가락으로 변주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농악 가락 또한 꿋꿋하고 힘찬 특징이 있으며 박진감이 넘친다.
<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국립민속박물관 >
《진주삼천포농악》 [晋州三千浦農樂]
[전승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 일원]
< 진주삼천포농악 ©국립무형유산원 >
《김천금릉빗내농악》 [金泉金陵─農樂]
[전승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 손영만 상쇠 금릉빗내농악 소개 ©국악방송 >
-
의의 및 가치
영남농악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신밟기와 같은 마을굿이 성행한 흔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남농악은 고형(故形)의 농악인 지신밟기와 같은 축원농악(祝願農樂)이 잘 계승되어 있으면서, 때로는 완전한 군대의 진법을 모의한 군사굿이라 할 만한 것도 있고, 순수한 모의 농사굿의 특징도 나타난다. 오늘날 농악이 마을의 오솔길이나 논바닥을 떠나서 광장이나, 미리 마련된 무대적 연희장(演戲場)에서 연행되면서 판굿의 연예형태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었다. 원래 ‘질굿’을 치고, 마을의 큰집 마당에서 놀고, 온 마을이 즐기는 판굿으로 진행되던 농악은 무대화된 판굿만을 과장하여 놀게 되는 연희농악으로 변천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농악은 어느 곳이나 마을 단위로 생활 속에 밀착되어 전승되어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서구화에 밀려 농악이 점차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
지정사항
〈표 1〉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영남농악 종목 일람표
분류 번호 종목 소재지 지정일 국가 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경상남도 사천시 1966.06.29. 제11-7호 《김천금릉빗내농악》 경상북도 김천시 2019.09.02. 대구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4.07.25. 제2호 〈날뫼북춤〉 대구광역시 서구 1984.07.25. 제3호 《욱수농악》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8.05.30. 제4호 《천왕메기》 대구광역시 서구 1989.06.15. 경북 무형문화재 제4호 《청도차산농악》 경상북도 청도군 1980.12.30. 제40호 구미 《무을농악》 경상북도 구미시 2017.01.05. 제41호 경산 《보인농악》 경상북도 경산시 2017.01.05. 부산 무형문화재 제4호 〈동래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1977.12.13. 제6호 《부산농악》 부산광역시 서구 1980.02.12.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서구 2011.03.26. 제22호 《수영지신밟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4.01.01. 경남 무형문화재 제13호 함안 화천농악 경상남도 함안군 1991.12.23.
김천금릉빗내농악: 국가무형유산(1966) 진주삼천포농악: 국가무형유산(2019) 고산농악: 대구광역시 무형유산(1984) 날뫼북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1984) 욱수농악: 대구광역시 무형유산(1988) 천왕메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1989) 청도차산농악: 경상북도 무형유산(1980) 구미무을농악: 경상북도 무형유산(2017) 경산보인농악: 경상북도 무형유산(2017) 동래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무형유산(1977) 부산농악: 부산광역시 무형유산(1980)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무형유산(2011) 수영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무형유산(2014) 함안화천농악: 경상남도 무형유산(1991)
-
참고문헌
경상남도ㆍ경남발전연구원, 『경남의 무형문화재 국가지정ㆍ경상남도지정』, 민속원, 2013. 김택규 외, 『한국의 농악: 영남편』, 수서원, 1997. 부산광역시, 『부산의 문화재』, 부산광역시, 198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경북예악지』, 경상북도, 198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구의 예악』, 대구직할시, 1988. 정모희, 「대구ㆍ경북농악의 음악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집필자
정모희(鄭牟姬)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