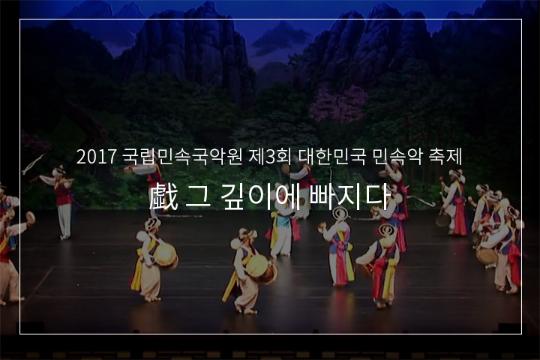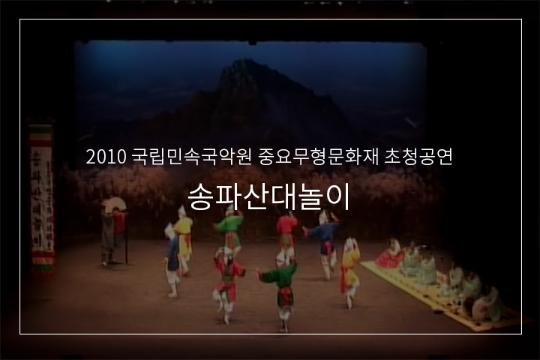-
정의
서울시 송파구 송파나루 장터에서 장꾼들과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산대놀이 -
요약
송파산대놀이는 서울지역 애오개, 구파발, 사직골 등에 있었던 ‘본산대놀이’를 이어받아 송파구 송파장터를 중심으로 전승된 탈춤이다. 대소명절과 장날에 송파장터에서 펼쳤고, 모두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며, 32개의 바가지 가면으로 비교적 고형을 보존하고 있다. 벽사의 의식무, 파계승에 대한 묘사, 양반의 풍자,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춤판은 삼현육각 반주에 염불 거드름춤, 타령 깨끼춤, 굿거리 건드렁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래
산대놀이는 조선시대 궁중 나례와 중국 사신 환영행사에 동원됐던 성균관 노비 반인(泮人)을 비롯한 재인(才人)·광대들에 의해 성립된 연희였다. 1634년에 산대도감이 폐지되자 한양 도성 근처의 민간에서 공연하면서 구파발ㆍ사직골ㆍ애오개 등지에서 산대놀이를 연희하였으며, 점차 노들ㆍ양주ㆍ송파ㆍ퇴계원 등지로 분파되었다. 송파산대놀이가 정착하게 된 송파진(松坡津)의 지명은 문종 즉위년인 1450년, 경기관찰사가 “삼전도(三田渡)보다 연파곤(淵波昆)이 물살이 빠르지 않으니 나루터로 하겠다”는 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소파곤(疎波昆), 소파리(疎波里)를 거쳐 송파(松坡)로 정착되었고, 송파장터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지원으로 산대놀이가 성행하였다. 연중행사로 명절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5월 단오와 7월 백중에는 장사씨름대회를 하며 7일씩 탈춤판을 벌였다. -
내용
[개요] 송파산대놀이는 서울·경기 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 탈놀이이다. 정월 대보름,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한가위 등 주로 명절에 연행되었다. 특히 음력 7월 백중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비용을 추렴하여 줄타기, 씨름, 산대놀이, 풍물 등 다양한 놀이를 벌였다. [절차와 구성] 송파산대놀이를 연행할 때는 시장의 공터에 둥글게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쳐 연행 공간을 만든다. 마당 한편에는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악사청과 맞은편에는 연희자들이 가면과 의상을 갈아입고 등퇴장을 하는 개복청(改服廳)을 마련한 다음 탈춤판을 벌였다. 송파산대놀이를 시작하기 전 연희자들이 풍물을 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길놀이를 한다. 개복청(改服廳)에 당도하면 마당 가운데 멍석을 깔고 고사상을 차린 후 가면을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상 앞에 승려와 양반탈들을 맨 위에 놓고 그 외의 가면을 늘어놓으며, 여성 배역의 가면은 맨 밑에 놓는다. 축문을 읽은 후에는 소지(燒紙)를 하고 선대 연희자들의 명복을 빌고 나서 음복한 떡을 구경꾼에게 나누어준다. 송파산대놀이는 모두 열두 과장으로 구성된다. 제1과장 〈상좌춤놀이〉, 제2과장 〈옴중ㆍ먹중놀이〉, 제3과장 〈연잎ㆍ눈끔적이놀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제7과장 〈노장놀이〉, 제8과장 〈신장수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 제10과장 〈샌님ㆍ말뚝이놀이〉, 제11과장 〈샌님ㆍ미얄ㆍ포도부장놀이〉, 제12과장 〈신할아비ㆍ신할미놀이〉이다. 른 탈춤과 마찬가지로 벽사의 의식무, 파계승에 대한 묘사, 양반의 풍자,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옴중의 장삼화장무 ©이병옥 >
< 노장춤의 복무 ©한남수 >
< 애사당 북놀이 ©이병옥 >

< 취발이마당의 취발이와 동자춤 ©이병옥 >
[춤사위] 송파산대놀이 춤사위는 해서탈춤과 달리 도약과 한삼사위보다는 손놀림 중심의 깨끼리 같은 손춤사위가 발달했다. 염불장단의 거드름춤, 타령장단의 깨끼춤, 굿거리장단의 건드렁춤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두 배역이 서로 마주 보고 같은 동작의 깨끼춤들을 엮어서 추는 맞춤이 있는데, 대무(對舞)와 원무(圓舞)의 춤사위로 나뉜다. 타령장단에 추는 ‘깨끼춤’은 화장무, 반화장, 자진화장, 곱사위, 여닫이, 여닫이어르기, 긴여닫이, 여닫이배치기, 배치기, 화장배치기, 어깨치기, 깨끼리, 염풍뎅이(연풍대), 돌단이, 거울보기, 팔뚝잡이, 멍석말이, 덜미잡이, 자라춤, 장단먹기, 궁둥치기, 배춤, 갈지자춤 등이 있다. 타령장단의 걸음걸이에는 까치걸음(양반, 취발이), 빗사위, 갈지자걸음, 뒷짐걸음, 원숭이재롱걸음, 활개걸음, 건들걸음, 껑충걸음이 있다. 염불장단의 거드름춤은 특수배역만이 추는 춤으로, 첫 상좌의 합장재배와 사방재배, 팔뚝잡이, 옴중의 용트림, 삼진삼퇴, 활개펴기, 활개접기, 장삼치기, 노장의 복무(伏舞) 등이 있다. 굿거리장단의 건드렁춤은 주로 등장할 때 건들걸음으로 다양한 팔동작으로 추는 춤으로 뒷짐사위, 들사위, 쳐들사위, 흔들사위, 돌사위, 멜사위, 빗사위, 얹는사위, 사뿐뛸사위 등이 있다. [복식·의물·무구] 송파산대놀이의 팔먹중의 복식은 고의적삼에 반장삼으로 길이는 무릎 위까지 내린다. 색상은 주로 빨강·파랑·노랑·초록색이며, 옷깃은 반대색으로 반장삼 끝자락까지 이어 붙였다. 기타 배역들은 조선시대 신분별 복색과 의물을 소지한다. 송파산대놀이에서 현재 사용하는 탈은 32개로 《양주별산대놀이》의 탈과 유사하나 얼굴의 형태나 색채, 색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목구비는 둥글고 큰 코, 불거져 나온 볼, 길게 벌어진 입술, 주름진 이마 등 다소 과장된 형태를 띠고 있다. 색채는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어둡고 짙은 느낌을 준다. 송파산대놀이의 탈은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허호영 제작 탈과 1978년 이후 한유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탈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현재는 한유성 제작 탈을 사용하고 있다. [반주 음악] 송파산대놀이에 쓰이는 음악은 길놀이에서 연주하는 행진음악과 놀이마당에서 연주하는 반주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길놀이 악기는 호적 한 쌍ㆍ북ㆍ장고ㆍ바라로 편성된다. 길놀이 행진에는 〈능게〉를 연주하고, 길놀이가 끝날 무렵에는 〈타령〉을 연주한다. 춤을 반주할 때는 피리 한 쌍ㆍ대금ㆍ해금ㆍ장구ㆍ북으로 구성된 삼현육각(三絃六角) 편성으로 《대풍류》의 〈염불〉ㆍ〈허튼타령〉·〈굿거리〉 등을 연주한다. [역사적 변천과 전승] 송파산대놀이의 연희자 허호영(許浩永, 1914~1990)에 따르면, 본산대놀이에 의해 성립된 송파산대놀이가 중도에 쇠퇴하면서 1900년대 초 그의 부친 허윤(許鈗, 1867~1935)이 《구파발본산대놀이》의 연희자 윤희중(尹熙重, 1840~1923)을 초빙해 재건했다. 1900년대 초 재건된 송파산대놀이는 7월백중 때에는 장터에서 낮에 씨름대회를 열고 저녁에 등불을 둥글게 설치하여 환하게 밝혀 놓고 12마당 산대놀이를 밤새껏 펼쳤다 한다. 그후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인해 송파나루 장터는 폐허로 변하였고 신송파로 이전한 시장의 규모가 쇠퇴한 상황에서 산대놀이 전승도 약화되었다. 줄타기 초청도 어렵고 씨름대회도 약화되자 야간에 펼치던 산대놀이를 낮에 탈춤판을 간간히 열었다. 한편 이웃 동네에 위치한 돌마리(석촌동(石村洞) 주민들도 겨울에는 매년 움막(공청, 깊은사랑)을 지어놓고 사랑방처럼 지내면서 탈도 만들며 산대놀이의 명맥을 이었다. 송파산대놀이의 현대 전승은 1960년대 허호영을 중심으로 복원하여 197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았으며, 허호영(탈제작ㆍ옴중ㆍ노장), 이충선(李忠善, 1910~1989, 장고ㆍ대금ㆍ피리), 김윤택(金澗澤, 1904~1979, 상좌ㆍ취발이ㆍ초라니ㆍ신주부), 이범만(李範萬, 1907~1984, 옴중ㆍ샌님ㆍ신할아비), 한유성(韓有星, 1908~1994, 포도부장ㆍ샌님), 문육지(文陸地, 1913~1992, 상좌ㆍ먹중ㆍ무당) 이상 여섯 명이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84년에는 석촌호수에 서울놀이마당과 송파산대놀이 전수관이 건립되어 보다 안정적인 전승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김학석(金學錫, 1940~2014, 무당)이 보유자로 인정됐으나, 2014년 작고했다. 2022년 현재 명예보유자 이병옥(李炳玉, 1947~ , 상좌ㆍ취발이)과 보유자 함완식(咸完植, 1956~ , 옴중ㆍ먹중)을 중심으로 송파산대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
의의 및 가치
송파산대놀이는 구파발ㆍ애오개ㆍ사직골 등지의 본산대놀이가 소멸된 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전승되는 유일한 산대놀이이다. 특히 송파산대놀이는 《구파발본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은 산대놀이로 양주, 퇴계원의 산대놀이와 함께 본산대놀이의 명맥을 잇고 있다. 따라서 송파산대놀이 연희대본에는 구파발 산대놀이와 관련한 지명들이 나타난다. 제6마당에서 쓰러진 먹중을 보고 ‘고택골’로 갔다고 말하는데, 고택골은 과거 은평구에서 유명했던 공동묘지였다. 제9마당에 등장하는 취발이는 뒷산 솔개와 마주치는 곳을 ‘무악재’라고 소개한다. 이처럼 대사에 나오는 ‘무악재’, ‘고택골’은 구파발ㆍ녹번 등 인근의 거주자들에게 친숙한 지명이며, 송파산대놀이가 전승됐던 송파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구파발본산대놀이》 재담에 나오는 지명이 송파산대놀이에 전해지면서 취발이ㆍ먹중 등 배역들의 대사에 남게 된 것이다. 송파산대놀이 탈은 과거 애오개ㆍ녹번ㆍ구파발ㆍ사직골ㆍ노량진 등 다양했던 산대놀이가 현재 3종(송파, 양주, 퇴계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대놀이 탈 32종을 갖추고 있어 다양성을 더 해줄 뿐만 아니라, 전통 바가지탈의 상징성과 조형미를 한 차원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정사항
송파산대놀이: 국가무형유산(1973)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2022) -
참고문헌
이두현, 『한국의 탈놀음』, 일지사, 1996. 이두현, 「송파산대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90, 1971. 이병옥, 『송파산대놀이 연구』, 집문당, 1982. 이병옥, 『송파산대놀이』, 피아, 2006. 이효녕, 『송파산대놀이의 전승과 변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전경욱, 『한국의 탈놀음』, 열화당, 2007.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 학고재, 2020. -
집필자
이병옥(李炳玉)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