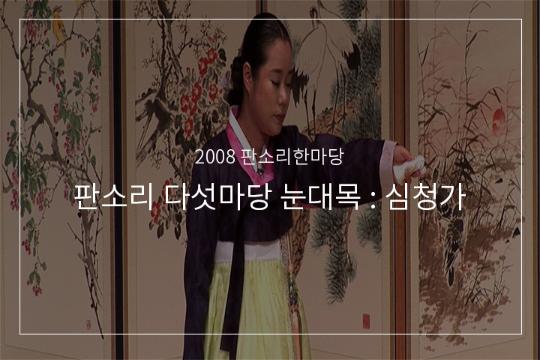국악사전의 모든 원고는 공공누리 제2유형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출처 표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의
판소리 한 바탕 가운데 창자들에 의해 많이 불리는 주요한 대목. -
요약
판소리 한 바탕은 보통 2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대목이거나 음악적 기법이 뛰어나 판소리 창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주 부르는 대목이다. -
유래
눈대목이라는 용어는 판소리의 공연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표현으로, 명창들이 공연 중 가장 공들여 부르는 대목을 ‘눈’이라 이르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임방울 명창이 「수궁가」 공연 중 <토끼화상> 대목을 부르며 “이 토끼화상이라는 게 퇴끼타령 전체에 배 가르는 디 허고, 이 화상하고 이, 눈이라 그랬는디……”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발언은 판소리 실연에서 특정 대목이 예술적 중심으로 인식되는 관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된다. 이후 ‘눈대목’이라는 표현은 학술적 논의와 공연 레퍼토리 소개에서 고유어로 사용되고 있다. -
내용
○ 개요 판소리는 서사적인 긴 이야기를 소리(노래)와 아니리(말)로 엮어 가는 장르이다. 한 바탕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장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이야기 중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사설의 문학적 표현과 음악적 기교가 응집되어 보다 치밀한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대목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극적 긴장이나 감정의 절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야기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특정 창자에 의해 개발된 더늠 대목이거나 판소리의 특징인 해학과 풍자가 두드러지는 대목의 경우에도 독특한 음악적 기법이 활용되면서 다른 대목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대목을 소리꾼들은 전체 한 바탕 중에서 주요한 대목이라 하여 ‘눈대목’이라 이른다. 눈대목은 판소리 한 바탕 중 사설 전개 및 음악적 표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으로, 여타 다른 대목에 비하여 창자들에 의해 더 자주 불리게 된다. 창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창자들의 예술적 역량이 눈대목에 더욱 집중되며, 그에 따라 해당 대목은 사설과 음악적 측면에서 더욱 높은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결국 눈대목은 작품의 서사적 중심이거나 예술적 표현이 극대화된 부분으로서, 판소리의 미학과 창자의 기량이 집약된 핵심 구간이라 할 수 있다. ○ 유형 연주자나 감상자에 따라 또는 전승 바디에 따라 ‘눈대목’이라 이르는 대목은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춘향가》 중 〈사랑가〉ㆍ〈이별가〉ㆍ〈옥중가〉, 《심청가》 중 〈범피중류〉ㆍ〈심봉사 눈뜨는 대목〉,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ㆍ〈박타령〉, 《수궁가》 중 〈토끼화상〉ㆍ〈고고천변〉ㆍ〈토끼 배 가르는 대목〉,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ㆍ〈동남풍〉ㆍ〈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눈대목이라 이르는 경우가 많다. ○ 역사적 변천 눈대목은 구술 전통 속에서 명창들이 공연 중 강조한 대목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으며, 더늠의 발전과 함께 개성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창되기도 하였다. 현대 공연에서는 눈대목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구성되며, 관객의 감정과 반응을 이끌어 내는 중심축이 된다. 또한 학술적 분석을 통해 눈대목의 문학적·음악적 구조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판소리의 예술성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의의 및 가치
눈대목은 판소리 한 바탕 중 문학적·음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대목으로, 극적 긴장과 감정의 절정을 담아낸다. 창자들은 눈대목에 예술적 역량을 집중하며, 반복된 연행을 통해 높은 완성도를 이루게 된다. 관객은 눈대목에서 가장 깊은 감동과 몰입을 경험하며, 공연의 흐름과 감정선을 따라간다. 눈대목은 더늠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창자의 개성과 작품의 중심이 겹치는 지점이 된다. 결국 눈대목은 판소리의 미학과 전통을 집약한 예술적 정수로서, 작품과 공연의 핵심을 이룬다. -
참고문헌
최동현, 「판소리의 눈대목」, 『문화재사랑』 136, 2016. -
집필자
신은주(申銀珠)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