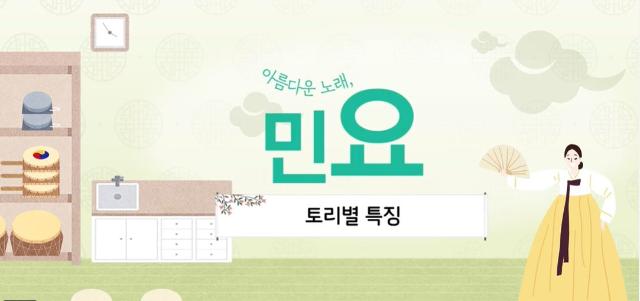-
정의
민요나 무악에서 지방에 따라 독특하게 구별되는 음악 양식적 특징. -
요약
토리는 선법, 선율진행의 특징과 시김새 등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총체적 음악 양식 유형 특성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토리는 문화권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며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개념이다. -
유래
토리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학술용어화하여 사용한 이는 이보형이다. 이보형은 토리가 ‘과거 음악인들이 지역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조, 악조나 서양음악 용어인 음계, 선법과 달리 시김새나 선율진행 특성 등 추가적인 요소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용어로서 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
내용
○ 개요
음악학에서 토리는 음악의 음고(音高) 체계의 정체성을 담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김새와 선율진행의 특징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역의 토리에 적용할 때에는 ‘지역명+토리’, 또는 ‘악곡명+토리’의 형태로 합성하여 쓴다. ‘지역명+토리’인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음고 체계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며, ‘악곡명+토리’인 경우에는 그 악곡에 나타나는 모든 음고 체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궁중음악이나 풍류음악 등에 사용해 왔던 ‘조’, ‘악조’를 민간에서 ‘조’, ‘쪼’. ‘쩨’와 같이 사용하였으나 음계나 선법의 의미에 제한하지 않고 선율진행 특성과 시김새, 종합적인 음악 양식적 특징을 담은 넓은 의미로 활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은 용어가 토리라 할 수 있다.
○ 유형
학계에서 사용하는 토리명의 종류가 많고 동일한 대상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토리명을 지역명과 악곡명, 또는 학술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용어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악곡명과 토리를 조합한 형태인데, 이는 동일 지역 사용되는 다양한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표 1〉 토리명 유형분류유형
사례
지역명+토리(조)
경토리, 동부토리, 남도토리, 서도토리, 남도경토리, 남부경토리
경서토리, 동남토리악곡명+토리(조)
메나리토리, 창부타령토리, 육자배기토리, 수심가토리, 베틀가토리,
한강수타령토리, 난봉가토리, 아라리토리, 어사용토리, 방아타령토리,
자진방아타령토리, 성주풀이토리, 오돌또기조, 서도개타령조학술적 조합어
진경토리, 반경토리, 진수심가토리, 반수심가토리, 신경토리
경토리1형,
경토리2형, 제1경토리, 제2경토리, 수심가토리1형, 수심가토리2형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토리 명칭을 혼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지역과 토리, 토리명칭, 음구조, 특징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토리명 유형분류 종합
지역
토리명
음구조
특징
경기
경토리, 진경토리, 창부타령토리, 제1경토리, 경토리 제1형
솔라도레미
종지음 솔
반경토리, 한강수타령토리, 베틀가토리
라도레미솔
종지음 라
남부경토리, 남도경토리, 성주풀이토리, 제2경토리, 경토리 제2형솔(라)도레미
종지음 도
떠는 음(솔)
꺾는 음(미-레)
북부경토리, 방아타령토리
솔라도레미
종지음 도
신경토리
솔라도레미
종지음 도
서도
수심가토리, 진수심가토리, 수심가토리 제1형
레미(솔)라도
떠는 음(라)
난봉가토리, 반수심가토리, 수심가토리 제2형
라도(레)미솔
떠는 음(미)
남도
육자배기토리
미라도-도시라미
상하행이 다름
떠는 음(미)
꺾는 음(도-시)
동부
메나리토리
미라도레-레도라솔미
상하행이 다름
하행시 ‘솔’
종지음 라
아라리토리
미라도레-레도라솔미
상하행이 다름
하행시 ‘솔’
종지음 미
어사용토리
도미솔라-라솔미레도
상하행이 다름
하행시 ‘레’
제주
제주토리
○ 유형별 음악적 특징
토리는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기본적으로 선법의 개념이 중요하므로 음계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민요는 대부분 5음음계로 되어 있으므로 '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 '미솔라도레', '미(솔)라시도', '레미솔라도'와 같은 구성음으로 나타난다. 이들 음구성은 선율진행 방식과 시김새에 따라 상, 하행이 다른 구조가 되기도 하고 생략되는 음에 의해 4음 음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토리와 반경토리 등 서울과 경기지역 토리는 5음을 골고루 사용하며 상하행이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동부의 메나리토리와 남도의 육자배기토리는 상하행이 달라지는 구조이며, 육자배기토리와 서도의 수심가토리, 난봉가토리 등은 생략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음들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표시해 두기도 한다.
음계상 5음을 골고루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차진행을 기반으로 하되 장식음적 시김새를 많이 활용하며, 생략되는 음이 있는 경우에는 굵게 떠는 소리와 흘러내리거나 꺾는 유동음적 시김새를 활용한다. 또한 흘러내리거나 꺾는 등의 하행성 시김새는 음계상의 위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역사적 변천
‘토리’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용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육자배기토리나 경토리와 같은 조합어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학술용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토리’가 국가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음악요소로서 학교 교육 현장과 국악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의의 및 가치
토리에는 선법적 특성으로 변별되는 것도 있지만 선법적 주음(중심음)을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시김새 차이, 중요음의 음정 차이, 관용적 선율형 차이 등 여러 가지 특성 차이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토리는 민요의 음악 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특징이 뒤섞여 있다. 나아가 토리를 기반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선법 전반을 설명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20.
김혜정, 『민요의 채보와 해석』, 민속원, 2013.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한국음악연구』 28, 2000.
김영운, 「동부민요 토리의 재검토-동부민요 하층위 설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61, 2017.
김혜정, 「초등음악교육의 토리ㆍ시김새 교육 현황과 향토민요를 위한 토리 이론의 재검토」, 『한국음악연구』 72, 한국국악학회, 2022.
김정희, 「민요 음조직론과 음조직명에 대한 제언」, 『한국민요학』53, 한국민요학회, 2018.
신은주, 「한국 민요 선법(토리)의 연구 성과 검토 및 논점」, 『한국민요학』 46, 2016.
이보형, 「토리의 개념과 유용론」,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음악학논총』, 2000.
이보형,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51, 한국국악학회, 2012.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2.
이보형, 「동남(東南)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4, 한국국악학회, 2008. -
집필자
김혜정(金惠貞)
-
검색태그
-
외부 링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