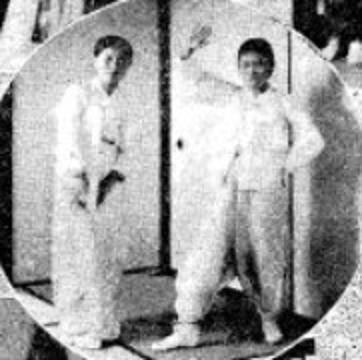-
정의
한성준이 창작한 춤으로, 무용수가 단가를 부르며 추는 2인무.
-
요약
한성준(韓成俊, 1874~1941)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공연 종목 중 하나로, 단가를 부르며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2인무 형태로, 한성준이 형식과 표현에서 새롭게 창작하여 1938년 5월 2일 부민관 초연 시 공연한 춤이다.
-
유래
단가(短歌)는 판소리 본 마당 전에 목소리를 푸는 짧은 노래인데, 한성준이 1938년 4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소개한 단가무에서 ‘단가라면 가야금병창’이라고 설명했듯이, 가야금병창에 부르는 노래 소리를 말하고 있다. 즉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를 춤으로 만들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창작 작품이었다. 동일한 기사에 올려진 단가무의 사진에서 무용수는 각각 남녀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였는데, 남녀 2인무로 소리를 주고받으며 춤추었던 것이 아닌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공연에서 2인무가 남녀인지 동성의 2인무인지는 불분명하다.
-
내용
1938년 5월 2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전조선향토연예대회(全朝鮮鄕土演芸大会)’ 중 ‘고전무용대회(古典舞踊大會)’가 올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1938년 4월 23일자 기사에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12개 작품이 실렸는데, 한성준이 특별히 창작한 춤으로 《단가무》를 소개하였다. 단가를 가야금병창으로 해왔으나,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는 조연옥, 조금향이 단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이 새로운 형식에 큰 기대감을 내포하는 글이었다. 이어서 조광회(朝光會) 주최 조선음악무용연구회 ‘고전무용대회’가 1938년 6월 23일 부민관에서 올려졌다. 이를 홍보하는 『조선일보』 6월 19일자 기사에도 앞의 공연과 동일한 출연진을 소개하며, 단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한성준의 새로운 창작한 춤이 형식과 표현에서 볼만하다고 소개하였다. 새로운 형식에 대한 인기로 《단가무》는 이후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순회공연에서 주요 공연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국순회공연으로 1938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회한 ‘조선고전음악무용대회 서선순업(朝鮮古典音樂舞踊大会 西鮮巡業) 공연’, 1939년 2월에 순회한 ‘조선음악무용대공연 남선순업(朝鮮音樂舞踊大公演 南鮮巡業)’ 등에서도 주요 작품으로 《단가무》가 올려졌다. 1940년 2월 27일 부민관의 ‘도동기념공연(渡東記念公演)’의 단가무 출연진에 한영숙과 조금향의 이름이 등장한다.
-
의의 및 가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1938년도 활동부터 일간지에는 ‘고전무용’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는 아직 ‘전통’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로, 한성준의 작품은 신무용 또는 권번의 예기 춤과 다른 양식의 민족적 정서를 지닌 춤으로서 ‘고전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흩어졌던 우리의 문화 자원을 집대성하여, 전통적 방법론으로 재해석, 창작한 한성준의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는 당대 뿐 만 아니라, 후대에 이어지는 새로운 전통의 재창출로서 의미가 깊다고 여겨진다. 명무이자 명고수로서 음악적 깊이와 춤의 폭을 융합하려 했던 한성준의 창작성이 단가무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단가무는 한성준이 당시에 지향한 ‘고전무용’의 소재를 통해 민족적 정서를 지닌 새로운 표현형식의 춤을 창작하고자 만든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애제자를 중심으로 단가무를 올림으로써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었음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영희,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32, 2002 성기숙,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설립배경과 공연활동 연구」, 『한국무용연구』32권 3, 한국무용연구학회, 2014. 윤중강, 「무척 잘했음에도 매우 안타까웠던 이유: 서울춤연구시리즈 1. 묵은 조선의 새 향기」, 『댄스포스트코리아』 2024.09. 이정노, 「한성준의 조선춤 작품에 나타난 탈지역성과 탈맥락화 양상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37권1,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고전무용대회 조선특산품전람회기념 전조선향토연예대회」, 『조선일보』 1938. 4. 23. 「현황(眩恍)․찬란(燦爛)한 무아경(無我境) 고전무용대회 수재현(遂再現)」, 『조선일보』 1938. 6. 19. 「조선고전음악무용대회서선순업 고전음악무용대회」, 『조선일보』 1938. 9. 14.
-
집필자
박선욱(朴羨昱)
-
검색태그
-
추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