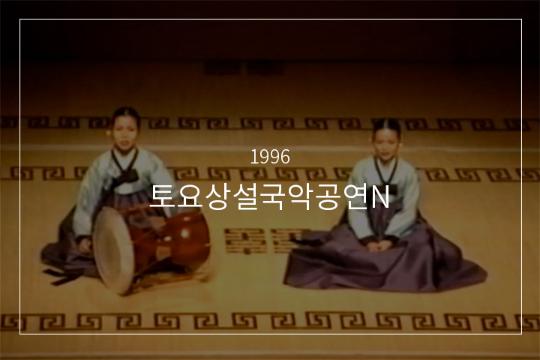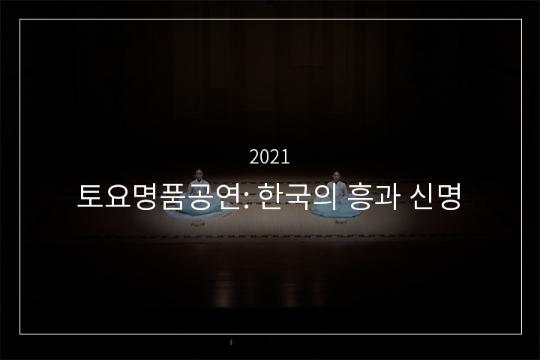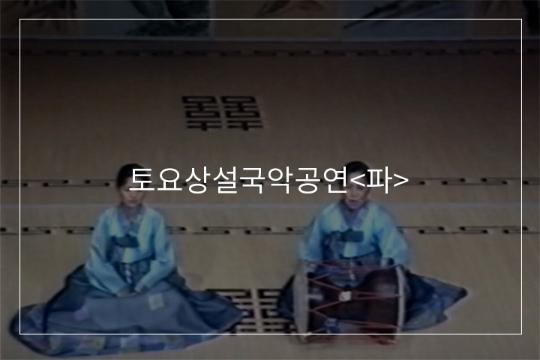-
정의
휘모리잡가 중 한 곡으로, 육칠월 장마에 대비되는 팔자를 가진 두 인물이 대화체 방식으로 부르는 곡.
-
요약
-
유래
20세기 초 서울지역에서 전문 소리꾼에 의해 불리던 노래로, 현행 노랫말과 유사한 것이 이용기가 펴낸 『악부』(고대본)에 ‘역금’으로 전한다.
-
내용
○ 역사적 변천과 전승 20세기 초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잡가꾼들 사이에서 널리 불렸던 소리이다. 서울지역 소리꾼들은 먼저 경기잡가를 부른 뒤 선소리를 부르고 제일 마지막에 《휘모리잡가》를 불렀다고 한다. ○ 음악적 특징 ‘솔(sol)-라(la)-도(do′)-레(re′)-미(mi′)’의 ‘솔(sol)’선법으로 이루어진 5음 음계 평조이다. 3ㆍ3조의 사설을 규칙적으로 3소박 2박 구조로 노래하며, 불규칙한 장단으로 부르는 휘모리 잡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 형식과 구성 육칠월 흐린 날은 장마철에 대비되는 두 인물의 대화를 익살스럽게 묘사한 곡이다. 육칠월 흐린 날의 노랫말에는 서로 처지가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처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나타나며 대화체 방식으로 곡이 진행된다. 전반부의 내용은 머슴에게 청을 하는 인물이 주체가 된다. 장마철에 잡힌 물고기를 님의 집에 전해달라는 내용이 전반부 내용이다. 반대로, 후반부는 팔자가 기박한 머슴들이 힘든 하루 일과를 나열한 후, 한 달에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한다.
-
노랫말
<1절 육칠월 흐린 날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 낫 갈아 차고 큰 가래 메고 호미 들고 채쭉 들고 수수땅잎 뚝 제쳐 머리를 찔끈 동이고 ...(중략)... 2절 우리도 사주팔자 기박하여 남의 집 멈 사는고로 새벽이면 쇠물을 하고 아침이면 먼 산 나무 두세번 하고 낮이면 농사 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정밤중이면 국문자(國文字)나 뜯어보고 한 달에 술 담배 곁들여 수백 번 먹는 몸둥이라 전할지 말지 ©국립국악원 편,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8집 「선소리와 잡가」 , 133쪽.
-
의의 및 가치
육칠월 흐린 날은 처지가 대비되는 두 명의 인물이 대비되는 사설의 내용을 통해, 근대 시기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서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강희진, 「휘모리잡가의 전승양상과 음악적 구조의 고찰」,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국립국악원,『한국음악자료총서』 제28집 「선소리와 잡가」, 국립국악원, 1995. 송은도, 『휘모리잡가』, 민속원, 2018. 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팔도소리』, 브리테니커회사, 1984. 이창배,『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
집필자
송은도(-)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