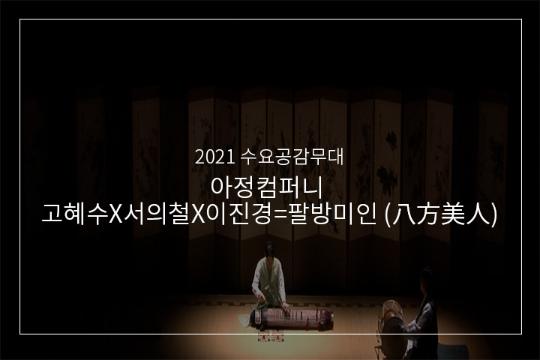-
다른 이름
현금병창(玄琴竝唱)
-
정의
-
요약
-
유래
-
내용
거문고병창은 10분 이내의 길이에 단가와 같이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중중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류와 인생을 즐기거나 새소리를 모사(模寫)하는 등 본래 판소리 대목이었던 사설과 이를 거문고로 연주한 선율의 대비가 돋보인다. 예를 들면 거문고병창 〈팔도유람가(八道遊覽歌)〉는 판소리 단가로도 불리며, 특히 가야금병창으로 불리는 〈명기명창(名妓名唱)〉과 동일한 곡이다. 또한, 《적벽가》 중 〈새타령〉은 판소리의 한 대목을 채용한 곡이다.
< 2014년 뿌리를 찾아서: 거문고산조 중 거문고병창의 공연 영상이다. ©국립무형유산원 > -
노랫말
〈팔도유람가(八道遊覽歌)〉
명인명창1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냥갓 방패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쇠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름아리 멋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명 모두 모아 각기 찬합행찬 장만허여 팔도강산을 구경가세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과 섬진강을 구경허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허고 평안도 잠울산2 대동강을 구경허고 황해도 구월산과 옹진수를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산과 세류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과 두만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십리 청룡이요 태산태악은 천봉금성이라 종남산은 천년산이요 한강은 만년수라 북악은 억만봉이요 상봉삭출은 대춘색허고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새는 지령허여 만리건곤 만안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장안의 서장대 이화정 당춘대 필운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 경 구경을 허여가면서 헐 일을 허며 놀아
《적벽가(赤壁歌)》 中 〈새타령〉
산천(山川)은 험준(險峻)허고 수목(樹木)은 총잡(叢雜)헌디 만학(萬壑)3에 눈 쌓이고 천봉(千峰)의 바람이 칠제4 화초목실(花草木實)이 바이 없어 앵무원학(앵무원앙: 鸚鵡鴛鴦)이 끊쳤는데 새가 어이 울랴마는 적벽화전(赤壁火戰)의 죽은 군사(軍士) 원조(寃鳥)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曹丞相)5을 원망(怨望)하며 지지이6 앉어 울음을 울제7 나무나무 가지마다 끝끝더리 않어8 울음을 울제9 도탄(塗炭)의 쌓인 군사(軍士) 고향(故鄕) 이별(離別)이 몇 핼런고10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11라 설이12 우는 저 두견새 여산군량(如山軍糧)13이 쇠진14헌데 촌비노략(村匪擄掠)이 한 때로구나 솟뎅 소뎅 저 흉년(凶年)새 백만(百萬) 군사(軍士)를 자랑터니15 금일(今日) 패군(敗軍)이 웬일인가 비비쭉 저 비쭉새16 자칭(自稱) 영웅(英雄)은 간 곳 없고, 백계도생(百計圖生)의 꾀로만 남아 꾀꼬리 수리루루 꾀꼬리 초평대로(草平大路)마다 허고 심산총림(深山叢林)의17구리가 까옥18 가련(可憐)허구나19 주린20 장졸(將卒) 냉병(冷病)인들 아니 들랴 병(病)이21 좋다고 쑥국 장요(張遼)22는 활을 들고 살23이 없다 서러마라24 살간다고25 수루루루루 저 호반(湖畔)새26 반공(半空)에 둥둥 높이 떠 동남풍(東南風)을 내가 막어 주려느냐 너울 너울이 저 바람에 철망에 벗어났네27 화병(火兵)아 우지마라 노고지리28 노고지리, 저 종달새 황계(黃蓋)29 호통(號筒) 겁을 내여 벗은 홍포(紅布)를 내 입었네 따옥 따옥이 저 따옥이 적벽풍파(赤壁風波) 밀어온다 어서가자 저 헤오리30 웃는 끝에는 겁낸 장졸(將卒) 갈수록이 얄망굿다31 복병(伏兵)을 보고 도망(逃亡)을 한다 이리로 가면서 뱅당당 저리로 가면서 뱅당당 사살맞은32 저 할미새 적벽화전(赤壁火戰) 패군지장(敗軍之長) 순금(純金) 갑옷을 어디다가 두고 살33도 맞고 창(槍)에도 찔려 기한(飢寒)이 골몰(汨沒)외야34 불어진35 창, 꺾인 활이며 울부러진36 전렵37을 휘겨쓰고38 위국(魏國) 고향으로 울고 간다.
1) 가야금병창 곡 중에 <명기명창(名妓名唱)>이 있고 이 곡과 거의 동일한 선율로 진행한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의 사회 정서상 ‘명기(名妓)’는 저속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신쾌동은 이를 ‘명인명창’으로 개사했다. 따라서 신쾌동에 의해 전승된 거문고병창 <팔도유람가>는 ‘명인명창’으로 노래한다.
2) 평안도의 잠울산, 저물산 등의 이칭이 있으나, 실존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전승자인 김영재는 ‘잠울산’으로 기억하고 있음.
3) 모든 골자기
4) 바람이 불 때
5) 승상 벼슬을 지낸 조조
6) 지지거리며
7) 울 때
8) 끝끝터리 앉아(끄트머리에 앉아)
9) 울 때
10)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가 되었는가
11) 귀촉도(歸蜀道) 귀촉도(歸蜀道) 불여귀(不如歸); 귀촉도나 불여귀는 모두 소쩍새의 다른 이름. 굳이 의미를 붙이면 ‘촉나라 땅으로 돌아가자, 촉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나으리라’로 해석.
12) 서럽게
13)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군 식량
14) 소진(消盡)
15) 자랑하더니
16) (입이) 삐쭉 삐쭉
17) 깊은 산, 우거진 숲에
18) 구리가 까옥; 까마귀 울음소리를 의성한 말
19) 가련하구나
20) 굶주린
21) 병에
22) 人名
23) 화살
24) 서러워마라
25) 화살을 쏜다
26) 물총새과에 속하는 물새. 그 울음소리가 화살날아가는 소리가 비슷하게 쓰여짐.
27) 철망(鐵網)을 벗어났구나
28) 종달새
29) 人名
30) 의미상 회오리로 추정
31) 겁먹은 장졸들이 도망갈수록 괴상하고 얄궂다, 야릇하고 밉다.
32) 辭說 많은
33) 활
34) 기한(飢寒)의 몰골(沒汨)이 되어
35) 부러진
36) ‘엉크러진’
37) ‘조선시대 융복(戎服) 또는 구군복(具軍服)에 병용한 갓’인 전립(戰笠)으로 보임.
38) 휘어쓰고, 또는 휘갈려 쓰고
-
의의 및 가치
병창 갈래를 논할 때 대부분 가야금병창을 지칭한다. 그러나 거문고병창의 전승은 전통악곡의 확장과 다양한 음악의 전승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가야금과 비교하여 술대를 활용해 대점 및 소점을 찍는 연주나 청을 긁어 소리내는 반주기법은 또 다른 맛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거문고의 악기 특성에 기인한 반주기법은 또 다른 맛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거문고병창은 전통의 보존과 창의적 수용의 결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단가 및 판소리 대목 등을 변형 및 발전시킨 예시로서 음악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갈래라는 의의도 함께 지닌다.
-
참고문헌
김영재, 『현금곡집』, 창명사, 1977. 김우진, 『거문고산조(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민속원, 2013.
-
집필자
김유석(金裕錫)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