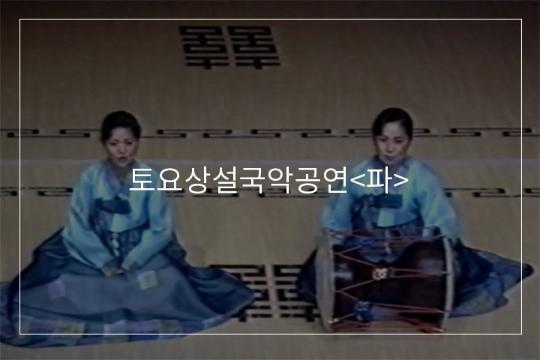-
정의
휘모리잡가 중 하나로, 서울 풀무골의 소리꾼 이현익이 지어 부른 곡. -
요약
-
유래
민족항일기에 활동하던 경서도 명창 박춘재(朴春載, 1881~1948)에 의하면 한 말에 서울 풀무골의 소리꾼 이현익(李鉉翼)이 지은 곡이라고 한다. -
내용
○ 연행시기 및 장소
《휘모리잡가》는 해학적 내용으로 사설을 촘촘히 엮어서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던 노래이다. 20세기 초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잡가꾼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던 소리이며, 먼저 경기잡가를 부른 연후에 선소리를 부르고 제일 마지막에 《휘모리잡가》를 불렀다고 한다.
○ 음악적 특징
장단은 볶는타령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사용하고 출현음은 ‘솔(sol)-라(la)-도(do')-레(re')-미(mi')‘를 사용하고, ‘솔(sol)’ 음으로 종지하는 전형적인 경토리로 부르는 노래이다.
○ 형식과 구성
병정타령은 ‘내드름-엮음-종지’의 세 악절로 구분된다. 짧은 내드름 선율을 노래한 후에 엮음 부분은 주로 4ㆍ4조의 사설을 3소박(3분박) 3박 또는 3소박 4박으로 노래한다. 이 곡의 첫 부분인 내드름 선율은 높은 소리로 질러 내어 부르고, 엮음 부분은 〈창부타령〉의 선율 위에 사설을 촘촘히 엮어 부른다. 종지 선율은 시조의 종지 선율과 같이 4도 하행하여 종지한다. -
노랫말
남의 손 빌어 잘 짠 상투영문에 들어 단발할제 상투는 베어 협랑에 넣고 망건아 풍잠아 너 잘 있거라 병정 복장 차릴 적에 모자 쓰고 양혜신고 마구자 실갑 각반치고 혁대 군낭 창 집탄자 곁들여 차고 글화총 메고 구보로 하여가는 저 병정아 게 좀 섰거라 말 물어보자 국립국악원 편,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8집 「선소리와 잡가」, 1995, 128쪽. -
의의 및 가치
병정타령은 옛 장형시조의 ‘말 물어보자’, ‘전하여 주렴’, ‘전할지 말지’의 구조를 받아들여 언어 유희의 측면에서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음악적으로도 전형적인 서울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국립국악원,『한국음악자료총서』 제28집 「선소리와 잡가」, 국립국악원, 1995.
송방송,『한겨레음악대사전』, 도서출판보고, 2012.
송은도, 『휘모리잡가』, 민속원, 2018.
이창배,『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이혜경, 「휘모리잡가의 사설 형성 원리와 향유 양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홍은주,『휘모리잡가』, 민속원, 2011.
-
집필자
송은도(-)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