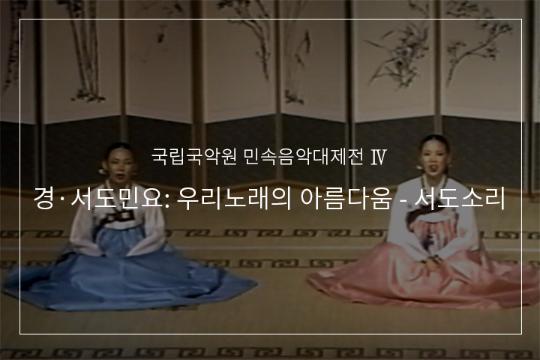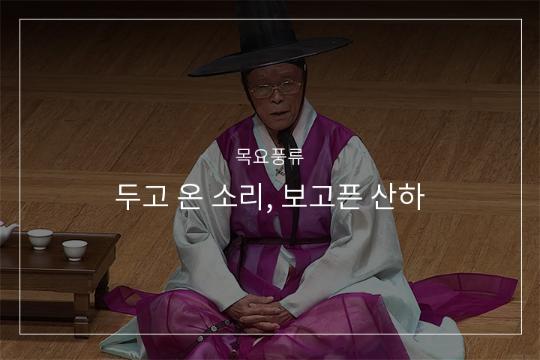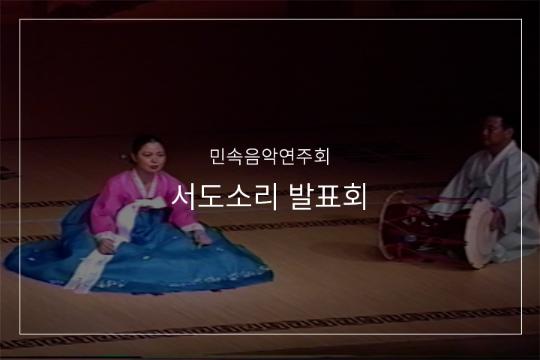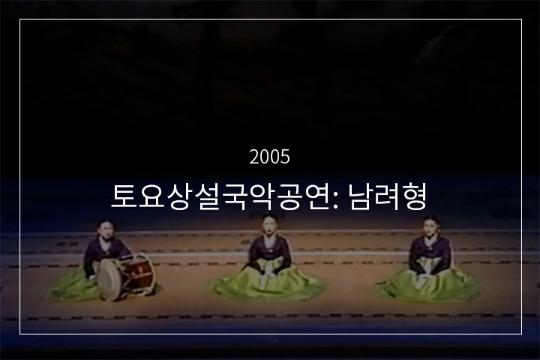-
정의
평안도 영변지역의 노래로, 진달래가 만발한 경치를 노래한 서도잡가. -
요약
약산동대(藥山東臺)의 유명한 진달래가 만발한 경치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유절형식으로 노래한다. -
유래
언제부터 불렸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조선 말기에 평안도의 행정부를 의주로 옮길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에서 영변가를 지어 불렀다고도 하고, 고향을 등지고 산길을 찾아 떠나던 사람들의 입에서 애달픈 별리의 감정을 담아 나온 노래라고도 한다. -
내용
○ 역사적 변천과 전승 1900년대 초기부터 서도잡가로 불렸고, 1915년 발행된 『정정증보신구잡가』에 사설이 처음 수록 되었으며 이후 17권의 잡가집에 사설이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승되었다. 음원 자료는 1912년 이정화(李正華, 1865~1920) ㆍ심정순(沈正順, 1873~1937)ㆍ박춘재(朴春載, 1881~1948)가 취입한 것이 최고본이며, 1930년대 이진봉(李眞鳳, 1900~?)이 취입한 음원 등이 전해진다. 현재로 전승되면서 노래의 원형이 축소되었으며, 20세기 초반의 영변가를 구조, 오늘날 불리는 영변가를 신조로 구분한다. 서도잡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서서 부르는 점이 특이하다. ○ 음악적 특징 ‘레(re)-미(mi)-솔(sol)-라(la)-도(do′)’의 음계로 구성되며, ‘레’ 음에서 종지하고 ‘라’ 음은 요성하여 수심가토리에 해당하지만 부분적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3소박 세마치장단을 기본으로 세 개~여섯 개가 모여 한 장단을 구성한다. 세마치장단은 여느리듬형을 갖추지 못하는 소(小)장단으로, 첫 번째 ‘노자/에’의 2음보 사설은 세마치장단 네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두 번째 ‘노자/노자’의 2음보 사설은 세마치장단 다섯 개, 세 번째 ‘젊어서노자’ 2음보사설은 세마치장단 여섯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룬다.< 김춘홍, 이정렬 노래, 서도잡가 <영변가>. ©국립무형유산원 >
○ 형식과 구성 현재 불리는 악곡은 5절의 유절형식에 해당한다. 1절의 선율이 2~3절에서 반복되고 4절과 5절에서는 선율이 변화된다.
-
노랫말
현재 불리는 영변가는 5절로 구성되지만 20세기 초반 잡가집에는 10절의 사설이 기록되어있다. 1절의 사설이 ‘영변의 약산에’ 시작하지만 대다수의 절에서는 ‘영변’과는 무관하게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나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절 노자/에/---/---/ 노자노/자/---/---/---/ 젊어/서/---/노/자/아/ 나도많/아/아--/병이나/들면은/---/ 못노/리/로/라/ 영변/의/---/---/ 약산의/동대로/다/---/아/아/ 부디/평안/히/---/너잘있/거/라/나도명/년/---/ 양춘은/가절이/로/다/ 또다/시/보/자/ 2절 오동/의/---/---/ 복편이/로/---/다/---/ 거문/고/---/로/구/나/ 후략... 오복녀 노래, <인간문화재 <오복녀 서도소리 제4집>>, 서울음반, 1994. -
의의 및 가치
영변가는 여타 서도잡가에 비해 부르기 쉬우면서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서도 지방의 멋을 살리는 악곡이다. 또한 여타 서도잡가가 통절형식에 수심가조로 마무리하는 데 반해 유절형식으로 구성되며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서도잡가의 음악적 다채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악곡으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박복희, 『서도소리 영변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성초, 『서도잡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집필자
이성초(李星草)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