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이름
난삼(襴衫), 난삼(幱衫)
-
정의
조선시대 유생이 생원ㆍ진사시의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와 관례의 삼가(三加)때에 착용한 예복으로 깃ㆍ도련ㆍ수구에 검정색 선이 둘러진 노란색의 단령이다.
-
요약
앵삼은 유생의 예복으로 단령과 같은 형태이나 소매끝과 도련에 이색의 단이 대어져 있다. 이러한 단을 란(襴)이라 하는데 난삼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며 앵삼은 그 바탕색이 꾀꼬리의 노란색과 닮은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 앵삼: 길이 138cm, 너비 176cm ©국립중앙박물관 > -
유래
난삼(襴衫)은 중국 고대복식인 심의(深衣)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의에 란(襴)과 거(裾)를 붙여서 만들었고 당(唐) 초기에 사인(士人)이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송사(宋史)』 여복지(輿服志)에 따르면 백세포(白細布)로 만들었고 둥근 깃과 넓은 소매가 달렸으며 허리사이에 벽적(辟積), 즉 주름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삼재도회』의 난삼 도식을 살펴보면 소매 끝과 깃, 도련에 선이 둘러진 단령의 형태이며, 『사례찬설(四禮纂說)』에도 난삼(襴衫)은 송(宋) 국자감(國子監)의 유생(儒生)이 착용하던 남색 비단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의 4~5치 정도의 단을 댄 둥근 깃의 옷으로 허리사이에 주름이 있는 옷과는 형태면에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심의형에서 단령형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에 유생복의 제도가 나오는데 치포건(緇布巾)ㆍ청삼(靑衫)ㆍ조아(條兒)로 구성되어 있다. 치포건은 복건(幅巾)을, 청삼은 난삼(襴衫)을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영조 22년(1746)에 과거 급제자의 명단을 발표하는 창방(唱榜)에 복두ㆍ난삼의 착용을 다시 제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영조 22년 9월 19일 기사에 보면 생원ㆍ진사의 창방 때 유건ㆍ청삼을 착용하였는데 안동향교에 보관돼있던 복두ㆍ난삼ㆍ대대를 가져다 살펴보고 옛제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 하며 옛 제도대로 복두ㆍ난삼을 고증하고 옛것은 다시 안동향교로 내려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동기년(大東紀年)』에 의하면 보면 유생이 과거를 볼 때에는 난삼에 복두(幞頭)를 쓰게 하였고, 또한 생원ㆍ진사에 대하여도 복두ㆍ난삼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난삼은 반령(盤領)으로 되어 있었으며 의색은 녹색이고, 깃ㆍ도련ㆍ수구에 조연(皂緣) 즉, 검은색의 난(襴)을 붙인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록에 의하면 복두ㆍ난삼은 유생의 공복일뿐만 아니라 생원ㆍ진사의 공복으로서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삼(襴衫)은 그 색상을 달리하여 관례(冠禮)나 상례(喪禮)의 예복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앵삼은 이러한 난삼의 일종으로 ‘앵(鶯)’이 의미하는 꾀꼬리의 색인 황색에서 명칭이 유래한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후기에 들어 과거(科擧) 급제자의 공복으로 발전하였다.
고종 29년(1892) 임진년진찬의궤에는 무동의 복식으로 여기의 화관과 비슷하게 생긴 화관과 원삼처럼 소매 끝에 색동이 달린 색동주위, 즉 색동 단령을 착용하는데 이는 여기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자년 진찬의궤에는 무동의 춘앵전 복식이 아견모ㆍ백질흑선착수의ㆍ옥색질흑선상ㆍ녹사괘자ㆍ홍한삼ㆍ오사대ㆍ호화로 구성된다. 그러나 복식도에는 백질흑선착수의와 녹사괘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백질흑선착수의는 표의로 생각되지만 정재도에는 착수형 소매에 뒤 중심이 트여있고 옷 전체에 무늬가 있는 표의를 착용하고 있어 복식 설명과는 다르다. 그러나 임인년(1902) 진연의궤에 그려진 무동의 춘앵전복식 그림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무동의 춘앵전 복식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이왕직아악부 시기인 1923년과 1930년 두 차례 춘앵전 공연이 있었다. 1923년 연행되었던 공연에서 무동이었던 이병호는 부용관을 쓰고 단령에 각대를 착용하고 녹수화를 신었다고 회고 한다. 당시의 기사(동아일보, 1923. 5. 15)의 사진을 보면 이병호의 회고대로 부용관과 각색 단령을 착용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춘앵전은 단절됐다가 1970년대 김천흥에 의해 재현되는데 이때 여령복식과 혼합이 이루어져 여령의 황초삼과 하피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여령의 황초삼을 “앵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황초삼의 노란색과 춘앵전의 명칭을 일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춘앵전 무복의 앵삼은 유생관복인 앵삼과는 형태적 관련은 없으며 단지 색상명에서 오는 명칭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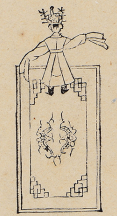
< 춘앵전 ©국립국악원 >

< 앵삼: 유생들이 과거급제와 관례의 삼가(三加) 때 입던 포ㆍ곡령깃에 소매가 넓은 형태임. 겉감은 초화문의 연두색 숙고사, 안감은 모란문의 노란색 갑사임. 깃 ㆍ 도련 ㆍ 소매끝에 검은색의 천을 댐. 수구 끝에 개밑단추가 있고, 겨드랑이에 각대걸이용 고리와 끈이 달림 ©국립고궁박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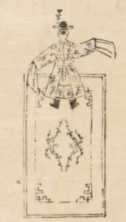
< 춘앵전:임인년 진연의궤에는 복식도는 있으나 복식에 설명은 없다. 그러나 1828년 진작의궤의 복식 설명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악원 >

< 춘앵전:이 당시 공연된 춘앵전은 독무가 아니라 군무로 공연됐음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부용관과 오색한삼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아일보 > -
내용 및 구성
즉 난삼(襴衫)은 선이 둘러진 단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앵삼에는 각대(角帶)를 매고 복두를 쓰며 목화를 신는 것으로 일습이 구성된다.
-
의의 및 가치
시대에 따라서 난삼의 색상에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청색 바탕에 검은 선을 둘렀고, 세종 때에는 옥색 바탕에 청색 선을 둘렀고, 선조 때에는 남색 바탕에 청색 혹은 검은 선을 둘렀다. 그리고 숙종 때부터는 옥색 바탕에 검은 선을 둘렀는데, 이것을 조선 말기까지 착용하였다. 난삼은 유생복ㆍ진사복ㆍ생원복으로 착용됐을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 착용되기도 하여 관례와 상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조상의 사당에 고하는 제례에도 이용되었다.
-
참고문헌
고광림, 『한국의 관복』, 화성사, 1990.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이순자, 『난삼(欄衫)의 연구(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집필자
박민재(朴民在)
-
검색태그
-
추천 자료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