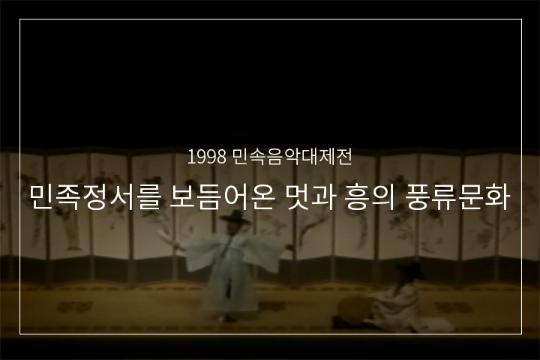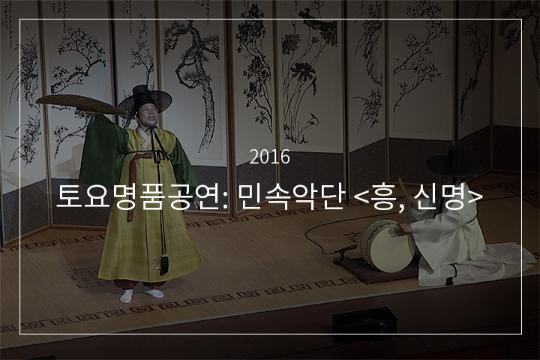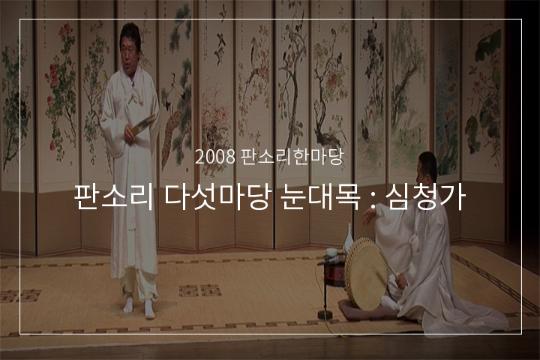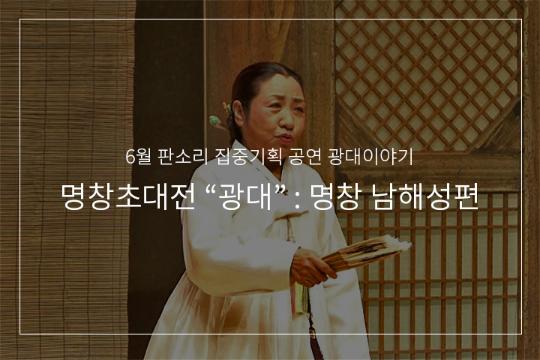-
다른 이름
<화초가(花草歌)>, <화초도 많고 많다>
-
정의
《심청가》 중 화초타령은 천자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한 심청이를 만나기 이전에 황후와 사별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 궁전에 화초를 가득 심어 놓고 구경하는 모습을 표현한 대목
-
요약
《심청가》 중 화초타령은 심청이가 부친의 눈을 띄우려고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을 타고 환생해 천자와 만남이 성사되기 이전의 장면이다. 화초타령은 황후를 잃은 천자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세상의 온갖 화초를 궁전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 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는 모습을 표현한 대목이다.
-
유래
《심청가》 중 화초타령은 〈화초가〉라고도 하며 사설의 첫 소절인 ‘화초도 많고 많다’를 인용해 대목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심청가》 중 화초타령은 19세기에 활동한 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이었던 정춘풍(鄭春風, ?~?)의 더늠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32년 중고제 명창인 김창룡(金昌龍, 1872~1943)이 「명창제 화초가(Columbia 40249-B(21042)」를 녹음하면서 ‘정춘풍 정선생제였다’라고 언급한 음반이 발굴되어 복각되면서 알려졌다.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심청가》의 이본 가운데 『박순호 소장 19장본』과 『박순호 소장 27장본』에는 골격만 갖춘 소박한 형태의 초기 화초타령 사설의 면모가 확인된다. 『박순호 소장 48장본』에서는 꽃의 종류가 추가되고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꽃의 모양을 풀이해 삽입가요로 부를 수 있는 화초타령의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김창룡이 방창한 정춘풍의 화초타령을 삽입가요의 형태를 갖춘 『박순호 소장 48장본』과 비교해 보면 4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한 형식은 동일하지만 사설이 전혀 다르다. 사설의 내용이 중국 전고(典故)와 한학(漢學)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춘풍은 “원래 유가(儒家)에서 생장하여 진사과(進士科)에 오른 만큼 한학의 조예가 상당하고 창극조에 대한 이론과 박식에 있어서는 고금을 통하여 남에 고창 신재효(申在孝, 1812~1884)요 북에 정춘풍”이라 일컬을 만큼 출중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춘풍은 중국의 전고와 한시를 인용하여 화초타령을 새로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춘풍의 화초타령은 19세기 이후의 《심청가》에 두루 수용되었지만 음악적 짜임은 후대에 걸쳐 일정하게 변화되었다. 정춘풍의 화초타령은 중모리장단에 우조로 되어 있지만 후대의 『심정순(沈正淳, 1873~1937) 창본』은 평타령, 『이선유(李善有, 1873~1949) 창본』은 늦은 중머리, 『박동진(朴東鎭, 1916~2003) 창본』은 진양조장단으로 부른다. 이외에 『정광수(丁珖秀, 1909~2003) 창본』ㆍ『김연수(金演洙, 1907~1974) 창본』ㆍ『김소희(金素姬, 1917~1995) 창본』ㆍ『한애순(韓愛順, 1924~) 창본』ㆍ『정권진(鄭權鎭, 1927~1986) 창본』은 모두 중중모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 하나인 〈무숙이타령〉의 사설이 기록된 『게우사』에는 화초타령을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명창 우춘대(禹春大, 1724~1776)의 특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설의 실체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으며 정춘풍의 화초타령과의 연계성도 확인된 바 없다. 더늠의 창시자로 알려진 정춘풍의 화초타령은 현재 그 전승의 명맥은 끊어졌으며 정춘풍의 더늠으로 알려진 대목으로는 화초타령 이외에도 《심청가》중 〈범피중류〉와 〈수궁풍류〉가 있으며 단가로는 〈소상팔경가〉가 있다. ○ 음악적 특징 중모리장단으로 구성된 김창룡이 방창한 더늠의 창시자로 알려진 정춘풍의 화초타령은 1옥타브~2옥타브에 걸친 넓은 음역을 사용해 다양한 꽃의 모습을 생기있게 표현한다. 전체 33장단으로 구성된 화초타령은 1~2장단은 A본청 우조길로 시작하지만 3~16장단까지는 D본청 우조길로 전조된다. 17~24장단은 D본청 평조길로 변화하며 25~30장단까지는 다시 D본청 우조길로, 31~33장단은 D본청 평조길로 종지한다. 종지는 전형적인 평조길의 형태이지만 끝음을 한음 들어서 종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조성음으로 부르는 화초타령은 이처럼 장단의 구간에 따라 우조길과 평조길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우조길의 주선율은 D본청이지만 선율의 골격은 본청(D) 위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아래의 음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어 평우조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D본청 우조길과 평조길의 차이는 본청 즉 선율의 골격을 유지하는 중심음은 D로 동일하지만 우조길에서는 상청이 F#으로 본청과 장3도의 음정관계에 있으며 평조길에서는 G로 완전4도의 음정관계를 갖고 있다. 사설의 붙임은 사설이 원박과 맞아떨어지는 대마디대장단에 3소박과 2소박의 혼분박을 적절히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중모리장단에 리듬감을 불어 넣어 경쾌함을 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시김새를 통해 천자가 꽃을 감상하는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 《심청가》 중 화초타령(소리:윤진철). ©국악방송 > -
노랫말
[중모리/평타령] 팔월부용(芙蓉)의 군자용(君子容) 만당추수(滿塘秋水) 홍련화(紅蓮花) 암향(暗香)이 부동(浮動) 월황혼(月黃昏)에 소식 전턴 한매화 진시유양거후재(盡是劉郞去後栽)라 붉어 있난 홍도화 월중천향 단계자으 향문십리 계화꽃 요렴섬섬 옥지갑에 금분야도 봉선화 구월구일에 용산음(龍山飮) 소축신(笑蓫臣) 국화꽃 공자왕손 방수하의 부귀할 손 모란화 천태산(天台山)을 들어가니 향인변계(兩邊開) 작약이며 촉국한(蜀國恨)을 못 이기여 제혈(啼血)하던 두견화 이화만지불개문(梨花滿地不開門)허니 장신궁중(長信宮中) 배꽃이며 칠십제자 강론(講論)허니 향단(杏壇)춘풍에 살구꽃 원정부지(遠征夫之) 이별(離別)허니 옥창오견(玉窓五見)에 앵두꽃 이화 도화 금선화 백일홍 영산홍 왜척촉 황국 백국 난초 파초 오미자 탱자 석류 감류 외앗 각색 화초 가진 과목이 층층이 심겄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우줄우줄 춤을 추는디 벌 나부 새 짐승이 춤을 추며 노래한다.
김창룡 방창 정춘풍제 <화초타령>
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 사설(1)」,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411~412쪽.
-
의의 및 가치
부친의 눈을 띄우려고 심청이가 남경장사 선인에게 몸이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심청가》 중 화초타령은 옥황상제의 자비로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 마침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제와 조우(遭遇)해 황후가 되기까지의 〈심청환생〉에 구성된 대목이다. 현전하는 화초타령은 황제가 화초를 구경하는 모습을 중중모리장단으로 풀어내면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의 극적 긴장감을 완화해 극의 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이야기의 변화를 예고하는 역할을 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 《심청가》 중 화초타령 (소리: 유영애) ©국립국악원 > -
지정사항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1964)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걸작(2003)
-
참고문헌
김석배. 「동편제 명창 정춘풍의 더늠 연구」, 『문화와 융합』 17, 한국문화융합학회, 1996.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 사설(1)」,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사은영, 「김창룡 방창 ‘정춘풍 「화초타령」’의 실상과 가치」, 『판소리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 『한국음반학』 1, 한국음반학회, 1991.
-
집필자
김민수(金珉秀)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