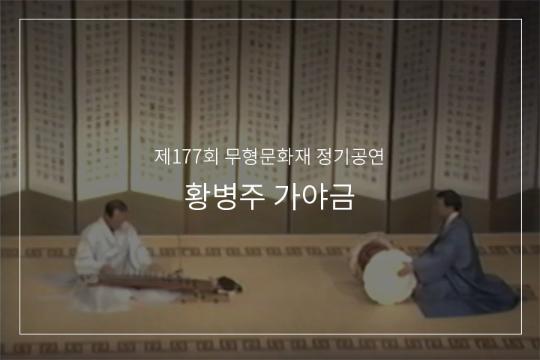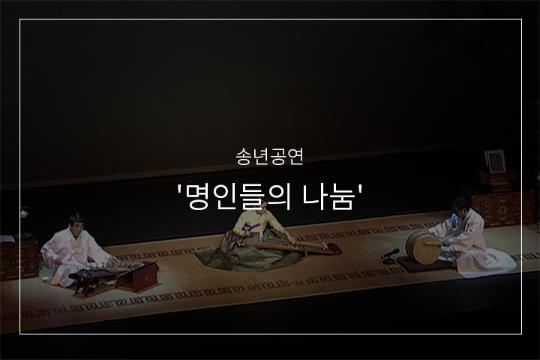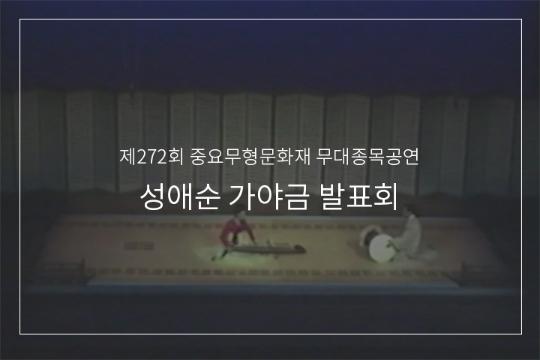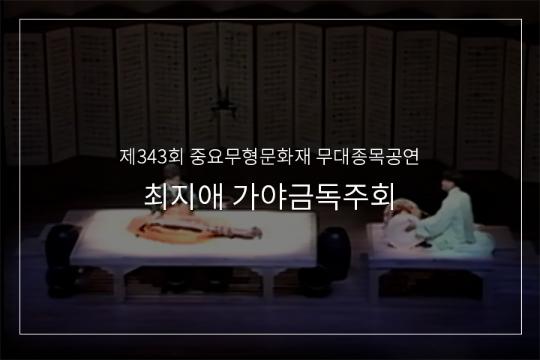-
다른 이름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
정의
최옥삼(崔玉三, 1905~1956)에게서 함동정월(咸洞庭月, 1917~1994)에게 전해진 가야금산조 유파 중의 하나
-
요약
-
유래
최옥삼은 장흥 출신으로 김창조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 문헌에는 정운용에게 배운 것으로 전한다. 제2세대 가야금산조명인 대부분이 김창조에게 사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옥삼은 13살(1918)부터 1년 남짓 김창조(金昌調, 1865~1919)에게 사사하였고, 그 이후는 김창조의 제자 한성기(韓成基, 1889~1950)에게 배웠다고 하므로 최옥삼 가락은 김창조- 한성기의 영향을 바탕으로 최옥삼이 지닌 작곡 능력으로 완성된 음악이라 하겠다. 그는 북한에서 최승희 춤 반주 음악의 작곡가로 이름났었고 광복 이후로는 북한에서 활동했으므로 적어도 40년대 후반 무렵까지 그의 산조가락은 완성되어 있었어야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어려서 배운 가락(1918-1919), 양기환 사랑방 활동과 장흥에서의 교류(1920-23), 목포, 장흥신청에서의 교습과 활동(1925-1938), 원산, 함흥에서 활동(1938-44) 등을 통해서 정리된 음악이 그의 제자 함동정월에게 완성형으로 전해진 것이 오늘날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라고 하겠다. 함동정월은 선생의 가락에 본인의 가락을 만들어 넣지 않았던 것을 구술면담으로 확인한 바 있고 잊었던 가락을 그의 말년에 명고수 김명환과 기억해내고 정리하여 1980년 무형문화재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본 곡은 구조적 탄탄함과 더불어 최옥삼 대에 정리된 음악으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 함동정월: 1985년 함동정월(가야금)과 한갑득(장구)명인의 연주 모습 ©국가유산청 >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함동정월이 육촌 형부뻘인 최옥삼에게 배워 전한 음악이다. 함동정월은 최옥삼이 원산 함흥 등지에서 공연활동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마다 그를 독선생으로 하여 가야금산조를 여러 번 닦였다고 하였다. 동시대의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이 본인가락을 만들어 늘여 갔으나 함동정월은 ‘뭐더러 이것저것 넣어 색동 만들어’라고 단호하게 반문하였는데, 이는 본 곡에 더 이상의 가락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본 곡의 빈틈없는 짜임을 함동정월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곡은 세대를 거치면서 선율이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최옥삼에게서 완성형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며, 한때 명고수 김명환과 함동정월의 기억을 되살려 가락을 찾아내었다고 한다. ○ 음악적 특징 다스름 ; 자유스러운 박자 구조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며, 본 곡의 진양조 앞 대목의 선율이 예시되어 있다. 제1, 2 단락은 옥타아브 관계로 음 양의 대비를 이루며 세 번째 단락은 우조선율로 풀어내는 대목이다. 진양조: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 의 큰 네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여느 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조 변조 조바꿈 등 본청이나 음구조의 변화, 임시적 조바꿈, 단락마다의 특징적 선율진행, 농현 기법 등, 산조가야금으로 표현되는 핵심적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옛 명인들은 자신의 연주가적 기량뿐만 아니라 가락 구성까지 진양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①우조대목에서는 e'-e(칭-동 11현-5현), a(땅, 7현) 본청의 계면길 선율이 주를 이루고 g 와 a 그리고 e음이 작은 단락의 종지음으로 쓰인다. ②돌장에서는 우조대목보다 장2도 아랫 조로 내려오며 평조길 선율로 바뀐다. 다만 종지선율 두 장단은 계면길로 바뀌어 마무리되며, 이 점은 여느 산조에서도 공통된다. ③평조대목을 본 곡에서는 봉황조라고 칭한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평조 –계면조 – 평조로 음 구조가 바뀐다. 두 장단 단위로 문답을 이루는 첫째 단락 선율과 진행은 김창조 대의 가야금산조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서 1세대의 음악이 현존 음악에 전해진 것을 확인하게 된다. ④계면조대목은 평계면 – 변계면- 진계면- 석화제- 생삼청 등으로 큰 단락이 여럿이며 단락별 선율 진행의 특징이 제각각이다. 평계면 대목에서는 계면조의 음구성음 중 본청의 위 음 쪽 진행으로 상행 형 선율이 많이 나타나 슬픈 느낌을 상쇄시켜 평조와 계면조라는 두 개 악상이 표현된다. 변계면 대목에서는 중간에 우조길로 변조됨으로써 구전된 조명 안에 음구조적 변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계면 대목에서는 반음 하행 형 선율을 많이써서 계면조의 슬픈 느낌이 표현된다. 석화제 대목에서는 두 개 본청의 계면길 선율이 음 기능을 바꾸어가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산조가야금의 음 구조 변화에 능통한 최 옥삼의 음악세계를 알게 해준다. 제자 함동정월 또한 구조적, 분석적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어도 연주로서 그 구조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승해 주었다. 마지막 단락 생삼 청 대목은 ‘외갓집목’ 또는 ‘새삼스런 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변계면 대목에서처럼 중 간에 우조길로 바뀌는 선율이 나온다. 중모리: 평우조로 시작해서 계면조, 경드름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단단위로 문답이 이루는 선율 짜임, 2분박 리듬꼴을 벗어나 3분할 리듬처럼 바뀌는 선율리듬의 변화, 경드름의 특징적인 선율진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중모리: “저정거린다”(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으면서 흥취를 살리는 느낌)는 표현에 걸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면선율이 전혀 쓰이지 않으며, 큰 단락은 5, 6, 7장단 등으로 길이가 다양하게 짜여 있다. 늦인자진모리: 평조로 시작해서 계면조, 변청으로 짜여있다. 중중모리보다 조금 당겨서 시작해서 단락별로 조금씩 빨라진다. 분명한 선율대구, 동일음형의 선율을 리듬길이의 축소로 잦아들게 하거나 장단의 단위를 흐트러뜨리는 선율 짜임, 2분박과 3분박 리듬의 빈번한 교차, 완전 4도 아래조로 바뀌는 변청 대목, 장단의 제약을 초월해서 진행되는 도섭 대목(카덴짜 역할) 등, 음 구조와 리듬 꼴의 변화는 물론이고 장단과 선율짜임의 다채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자진모리: 연퉁김 주법의 활용과 “말 뛰는 대목의 선율은 여느 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자진모리 장단 끝에 붙은 도섭가락은 최옥삼이 가야금을 다루는 솜씨(또는 가락을 만드는 솜씨)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어느 유파의 가야금산조에도 나타나지 않는 가락이다. 휘모리:계면길로 진행되는 가운데 청을 바꾸어 변화를 만든다. 늦인자진모리에서도 쓰였던 변청이다.
<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공연 영상 가야금/김해숙, 장구/조용복 ⓒ국립국악원 > -
의의 및 가치
함동정월이 스승의 산조에 본인 가락 만들어 넣는 것을 거두절미한 것을 보면 본 산조는 최옥삼 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된다. 초기 연구에서 산조를 즉흥성이 강한 음악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컸지만, 본 곡은 빈틈없이 작곡된 음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옥삼이 북한에서 최승희 춤 반주 음악의 작곡자와 연주자, 대금연주자로 활동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최옥삼은 성음이 빡빡해서 성음 면에서 제자 함동정월을 더 높게 평가하지만, 작곡가적 기량에서는 구전명인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고 하겠다. 전통명인들의 작곡법 연구나 산조선율을 짜나가는 방법, 산조가야금의 선율적, 구조적 활용, 음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김해숙, 「가야금산조의 음조직-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선율분석을 바탕으로-」, 『산조연구』, 세광출판사, 1987. 김해숙 채보, 『산조전집』, 뿌리깊은나무, 1989. 김해숙 채보, 『가야금산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1999. 성애순 채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
집필자
김해숙(金海淑)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