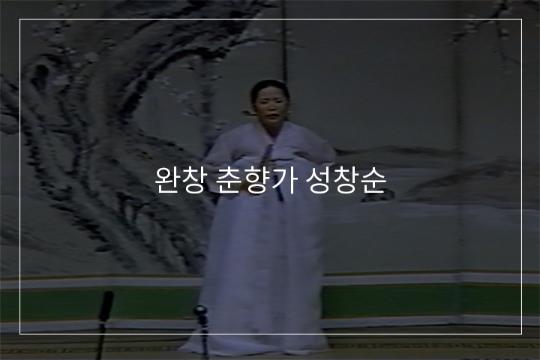-
정의
-
요약
이도령이 단오절을 맞아 방자에게 나들이를 가자고 명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역대 문장가들이 명승지에 머물 듯 이도령 자신도 문장가이므로 중국의 산과 강을 언급한 후, 방자에게 이와 같은 곳에 나들이차 나가자며 재촉하는 장면이다.
< 김수연 명창이 부른 《춘향가》 중 기산영수 ©국립무형유산원 > -
유래
소부와 허유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인물이다. 왕좌를 제의받고도 나랏일에 뜻이 없어 귀를 씻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들이 귀를 씻었다는 물이 영수(潁水)이며, 산으로 들어간 곳이 기산(箕山)인데, 오늘날 중국 호남성에 위치한다. 판소리 ≪춘향가≫의 <기산영수> 대목은 유진한(1711~1791), 신재효(1812~1884)의 사설집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내용
○ 역사적 변천과정 현존 창본 가운데 출생 시기가 가장 이른 김세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19세기 중반 이후임을 고려할 때, <기산영수> 대목은 대체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새로이 형성되어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전승되는 판소리 중에서는 김연수(金演洙, 1907~1974), 김세종(金世宗, 1830~?), 김소희(金素姬, 1917~1995)제 창본에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판본에 따라 기산영수가 등장하는 순서나 장단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 음악적 특징 기산영수 대목은 극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평조로 표현하지만, 특정 음보의 끝을 끌어올리거나 종지음을 짧게 처리해 우조적인 성격도 나타내고 있으므로 평우조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대목은 중중모리장단로 연행되고 있다. 으로 노래하고 있다. ○ 형식과 구성 말을 놓아가는 형식은 중중모리 한 장단을 4박으로 볼 때, 첫 두 박에 1 음보의 사설인 “기산영수”를 놓고, 나머지 두 박에 또 1 음보의 사설(놀고)을 분배하고 있다. 이렇듯 중중모리 한 장단 안에서의 4박 구조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노랫말에 따른 리듬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김수연 명창의 소리를 바탕으로 이 대목의 말붙임새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산 -/영 - 수/별 - 건/곤 - -/ /소 부 허/- - 유/놀 - 고/- - -/ /- - 채/석 강 -/명 월 -/야 - 의/ /이 적 -/선 - 도/놀 아 있/고 - -/
-
노랫말
중국 고사에 유래된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고사(古事)를 비롯해 다양한 문장가들과 그들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중중모리) 기산영수(箕山潁水) 별건곤(別乾坤), 소부(巢父) 허유(許由) 놀고 채석강(採石江) 명월야(明月夜)의 이적선도 놀아있고 적벽강 추야월(秋夜月)의 소동파도 놀고 시상리 오류촌 도연명도 놀아있고 상산의 바돌뒤던 사호선생이 놓았으니 내 또한 호협사(豪俠士)라 동원도리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허리 잔말 말고 일러라
※ 노랫말: 김수연 명창이 부른 《춘향가》 중 기산영수 ⓒ국립무형유산원
-
의의 및 가치
판소리 《춘향가》에서 시대 배경과 인물 소개에 이어 노래(창)로서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가 시작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상서로운 인물과 전설적인 문장가의 등장은 이도령의 품위와 신비로움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정렬제에는 이 대목이 생략되어 있다. 김연수제 창본에는 〈성춘향과 이도령의 내력〉 및 〈이도령과 방자가 남원경치 문답하는데〉에 이어 세 번째 노래로서 등장하지만, 김세종제 및 김소희제에서는 첫 번째 노래이다. 노래의 길이는 짧지만 이 행차의 결심으로 인하여 춘향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극(劇)의 발단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소희, 『판소리 다섯 마당: 춘향가』, 한국브리태니커, 1982. 최동현. 「명창 김세종의 생애와 판소리이론」, 『한국언어문학』 86, 한국언어문학회, 2013.
-
집필자
김유석(金裕錫)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