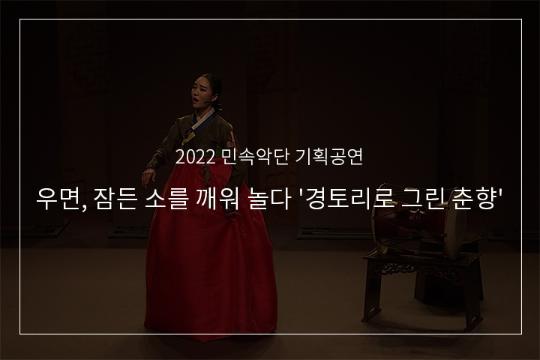-
정의
-
요약
형장가는 사설은 내용에 따라 춘향이가 집장사령에게 매 맞은 후의 정황과 월매의 원망, 춘향이 모친에게 건네는 말과 독백, 외롭고 힘든 춘향의 처지를 빗댄 주위 풍광을 묘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설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진행의 선율을 일정한 장단 수에 맞추어 반복한다. 6박 장단으로 부르며, 장단의 빠르기를 달리하여 선율에 변화를 준다. -
내용
○ 연행 시기 및 장소
형장가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애창되었으며 주로 민간의 유희 장소나 겨울철 파움 등에서 불렀다고 한다.
○ 음악적 특징
형장가의 음계는 ‘레(re)-미(mi)-라(la)-도(do′)-레(re′)-미(mi′)’로 구성되며, 느린 6박 장단과 빠른 6박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에서 나타나는 빠르기 변화 외에는 선율의 반복이 많아 단조롭게 느껴진다.
음계의 중심음은 라(la)이며, 중심음인 라(la)에서 다양한 시김새가 활용된다. 종지음은 레(re’)로, 선율의 마지막에서는 높은음을 향해 찍듯이 요성하는 시김새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낮은음을 순차적으로 붙여 빠르게 감아 내려 놓는 느낌을 주는 시김새도 나타난다. 형장가는 같은 음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그 음보다 아래 음들로 하행하는 특징이 있다.
형장가는 사설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선율 진행이 일정한 장단에 맞춰 반복된다. 장단은 6박 장단을 사용하며, 빠르기로 변화를 준다.
순차적인 하행종지에서 느린 6박 장단과 빠른 6박 장단이 번갈아 나타나며 속도 변화에 변화를 준다. 특히, 빠른 6박 장단 부분은 완전4도로 아래로 하행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형장가는 하강 진행과 빠른 장단으로 이루어진 역동성이 특징적이다.
○ 형식과 구성
형장가는 춘향이가 집장사령에게 매 맞은 후의 상황과 월매의 원망을 노래하는 부분과 춘향이 모친에게 건네는 말과 춘향의 독백 부분, 외롭고 힘든 춘향의 처지를 빗댄 주위 풍광을 묘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장가는 이러한 사설을 유절형식으로 부르며, 음악적으로는 종지 선율을 중심으로 총 22마루로 나눌 수 있다.느린 6박 장단과 빠른 6박 장단 부분이 각각 동일한 선율과 장단으로 되어 있다. 춘향이가 매를 맞는 상황에 대한 묘사 부분은 느린 6박 장단으로 월매의 원망, 월매와 춘향의 대화, 춘향의 처지를 풍광에 빗댄 부분은 모두 빠른 6박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장가는 독창자와 장구 반주만으로 단조롭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 명의 창자가 함께 부르기도 한다. 여러 창자가 함께 부를 때는 반주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반주 악기로는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장고 등이 사용되며 그 외의 악기를 편성하기도 한다.
느린 박자의 6박 장단과 빠른 박자의 6박 장단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형장가는 장단의 빠르기에 변화가 있는 곡으로, 유절형식에 해당한다. 음악적으로는 종지를 중심으로 22마루로 구분할 수 있다.
느린 6박 장단 부분의 선율은 순차적으로 하행종지를 하며, 빠른 6박 장단 부분에서도 하행으로 종지한다. 특히 빠른 6박 장단 부분은 완전4도 아래의 음으로 도약하여, 뚝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
노랫말
형장 태장 삼모진 도리매로 하날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에 맹장하니 일촌간장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일등춘향이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마라. 국곡투식 하였느냐 엄형중치는 무삼일고. 살인도모 하였는냐 항쇄족쇄는 무삼일고. 관전발악 하였는냐 옥골최심은 무삼일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어미가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 몰씁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해주렴. 날 죽이오 날 죽이오. 신관사또야 날 죽이오.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낭군님 날 살리오. 옥 같은 정갱이에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방울 떨어진다. 석벽강상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불고 벼룩 빈대 바구미는 에도 물고 제도 뜯네. 석벽에 섯는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유수 묘연히 뚝 떨어져 굽이굽이굽이 솟아난다. 이창배,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54, 76쪽. -
의의 및 가치
형장가는 판소리《춘향가》 중 신관 사또에게 모진 형벌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는 춘향이의 애달픈 모습과 서러운 푸념을 노래하는 부분을 잡가로 엮은 것이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표현하는 판소리《춘향가》와 다르게 십이잡가로 부르는 형장가는 느리고 빠른 장단의 변화와 도약 진행을 통해 비탄에 잠긴 춘향의 심정을 노래를 표현하였다. 사설에 따라 소리의 표현이 사실적인 판소리 춘향가와 달리 십이잡가 형장가는 사설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선율이 반복되어 사설의 전달보다는 선율 중심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민요』, 민속원, 2008. 김영운, 『한국민요학』, 한국민요학회, 2002. 성경린 외, 『국악의 향연』, 중앙일보사, 1988. 송은주, 『12잡가의 시대적 변화양상 연구』, 민속원, 2016. 송은주, 『십이잡가, 우리의 삶과 자연의 노래』, 민속원, 2020. 이창배,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54. 송은주,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4. -
집필자
송은주(宋銀珠)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