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이름
박판(拍板), 판(板), 단판(檀板)
-
정의
음악 합주의 시작과 끝, 악절의 전환, 또는 궁중정재(呈才)의 장단과 춤사위 변화를 알리는 데 사용하는 타악기
-
요약
박은 중국에서 전래 되어 통일신라 시대에는 박판, 고려 시대에는 박, 박판, 판, 단판으로 불리다가 조선 시대에 박으로 명칭이 정리된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음악을 합주할 때 시작과 끝 또는 악절의 전환을 지시하고, 궁중정재에서 장단과 춤사위가 전환될 때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유래
박은 박판이라는 이름으로 삼현ㆍ삼죽ㆍ대고와 함께 『삼국사기』「악지」에 통일신라의 악기로 소개되었으며, 9세기의 사리탑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에 새겨진 주악상에도 보인다. 발해 ‘정효공주의 묘’ 널방의 벽화에 악사가 들고 있는 악기를 박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시대에는 1114년(예종 9) 송에서 보낸 악기에 박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려사』「악지」의 향악기와 당악기 항목에 모두 수록되어, 향악과 당악 연주에 두루 쓰였던 정황이 드러난다. 박이 향악ㆍ당악에 동시 사용된 전통은 조선 시대로 이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아악까지 확장되기에 이른다. 오늘날에는 향악, 당악, 아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무대 위에서 관현합주를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박을 치는 사람을 집박(執拍)이라고 칭했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악인(樂人)인 전악(典樂)이 집박이 되어 연주의 시작[樂作]과 멈춤[樂止]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집박은 녹주의(綠紬衣)를 착용하여 일반 악인에 비해 격이 높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었다. 현재는 악장이나 음악감독이 녹주의를 입고 집박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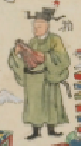
< 『기사진표리 진찬의궤』 헌가도, <박> ©영국국립도서관 >
-
내용
○ 구조와 형태 박은 폭 7cm, 길이 40cm 가량의 박달나무판 여섯 개를 묶어 만든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모과나무, 구지뽕나무, 산유자나무, 대추나무 등 단단하고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박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판 위쪽에 두 구멍을 낸 후 묶어 고정시킨 형태이며, 묶이지 않은 쪽의 나무판을 벌였다가 모으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무판 사이에는 엽전을 댄다.

< 『악학궤범』, <박> ©국립국악원>
○ 연주법 두 손으로 양 끝의 박달나무판을 하나씩 잡되 왼손으로 박의 윗판을 수평으로 들고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나무판을 부채처럼 활짝 폈다가 아래쪽 판을 급히 위로 들어 올려 여섯 판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딱’ 하고 타격하는 소리를 낸다. 이 음향은 나무판이 부딪쳐서 발생한다.
<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어린이를 위한 국악동영상 (타악기), <박> ©국립국악원 >
○ 연주곡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ㆍ〈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ㆍ〈낙양춘(洛陽春)〉ㆍ〈여민락만(與民樂慢)〉ㆍ〈여민락령(與民樂令〉ㆍ〈해령(解令〉ㆍ〈수제천(壽齊天〉ㆍ〈평조회상(平調會相)〉ㆍ〈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 등의 전통음악을 합주할 때 시작과 끝에 으레 박을 사용한다. 음악을 시작할 때에는 한 번, 끝날 때는 세 번을 치지만, 옛 악보에는 악절마다 박을 치기도 했다. 아울러 궁중정재의 장단과 춤사위가 변하는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박을 치기도 한다.
○ 제작 및 관리법 박은 여섯 개의 박달나무판의 끝에 각각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맞춰 나무판 사이에 엽전을 댄 후 가죽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가죽끈 끝에는 매듭을 드리워 장식을 한다. -
의의 및 가치
박은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실용성을 겸한 타악기의 하나라는 의의가 있다. 연주법이나 소리는 단순하지만, 악작과 악지 시점에 타격하여 합주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기능을 하며, 정재의 변곡점을 지시하기도 하여, 궁중의 음악과 춤 진행을 진두지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휘자가 없는 전통음악의 특성상 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박이 담당해왔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위상과 의미를 지닌다.
-
고문헌
『고려사』 『고려도경』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동국이상국집』 『삼국사기』「악지」 『악학궤범』 『조선아악요람』
-
참고문헌
『근현대 한국음악 풍경』, 국립국악원, 2007. 이동희, 「아악에서 박의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음악연구』 67, 2020. 이정희, 『궁궐의 음악문화』, 민속원, 2021. 하현주, 「박 연주 문화 연구 –통일신라부터 조선전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집필자
이정희(李丁希)
-
검색태그
-
추천 자료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