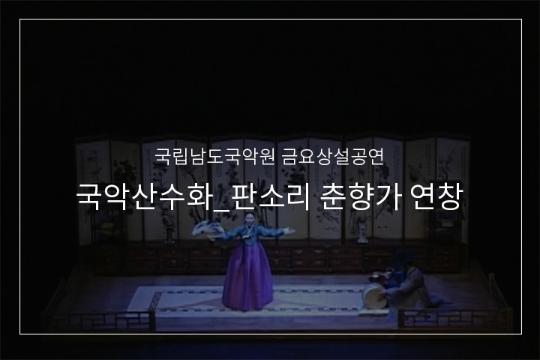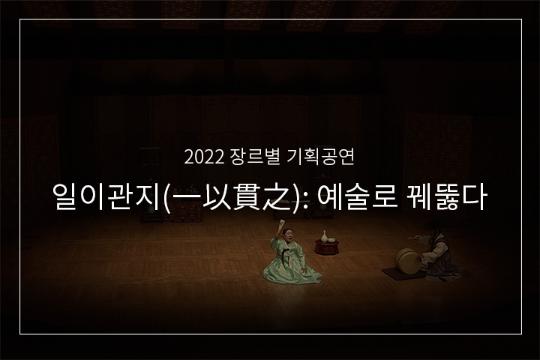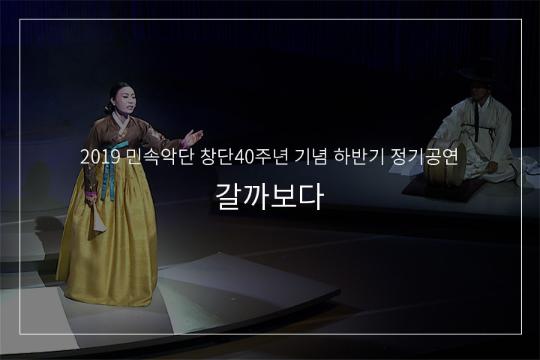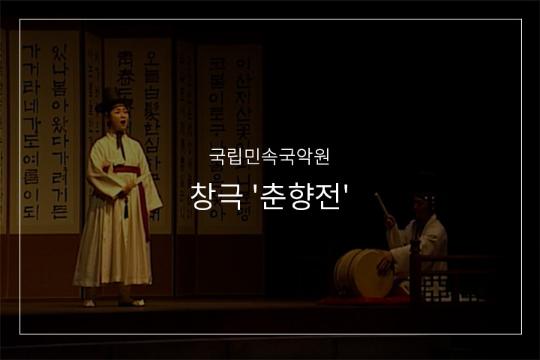-
다른 이름
갈까부다, 춘향자탄가(春香自歎歌)
-
정의
서울로 올라간 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이 함께 가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며 부르는 노래
-
요약
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 몽룡도 함께 상경하며 춘향과 이별하게 된다. 기약 없이 떠난 몽룡을 기다리는 도중 신관 사또가 부임하여 기생점고가 시작된다. 이 대목은 춘향이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모른 채 몽룡을 그리며 방에서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 춘향가 중 갈까부다 ©국악방송 > -
유래
신재효(19세기 중ㆍ후반) 판소리 사설본에 등장하는 갈까보다는 반복되는 사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가장 이른 시기의 사설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이름의 노래가 사당패소리에도 보여 조선후기 다양한 음악적 교섭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내용
○ 음악적 특징 이 대목은 전형적인 계면조 선율로 짜여져 있다. 노래의 사설 역시도 자연물에 자신을 빗대어 보지만 그 어떤 대상도 슬픔에 빗댈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움의 정도를 극도로 표현하는 부분(예를 들면 “은하수가 막혔어도”)에서는 상성(上聲)으로 질러내고, 매 단락을 종지하는 선율은 ‘do′si-la-mi-la-la’로 마무리하며 포기한 듯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창자들은 이와 같이 슬픈 감정을 유독 강조한 성음을 ‘진계면’ 또는 ‘애조(哀調)’라 부른다. ○ 형식과 구성 갈까보다는 좁은 의미로 “갈까보다”로 시작하는 내용을 한정해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아차 아차 내 잊었다” 하며 월매가 사령을 맞이하는 장면과 “백구타령”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갈까보다 가사는 3ㆍ4조 또는 4ㆍ4조로 비교적 정형적 운율이 맞추어져 있다. 이도령을 따라갔어야 하는 아쉬움을 자신에 비유해 자연물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천리ㆍ만리와 같은 거리적 개념을 점층화하고, 수진이ㆍ날진이ㆍ해동청ㆍ보라매 등을 등장시켜 그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날짐승, 편지, 견우직녀성, 겨울바람 등과 같이 거센 자연대상이 자신의 슬픔에 비할 바 없음을 강조하며 한탄하는 어조로 구성되어 있다.
-
노랫말
(창조 아니리) 그 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군로가 오난지 아무런 줄 모르고 독수공방(獨守空房) 주야상사(晝夜相思) 세월을 보내는디, (중모리) 갈까부다 갈까부네 님을 따라서 갈까부다 천리(千里)라도 따라가고 만리(萬里)라도 따라 나는 가지 바람도 수여넘고 쉬어넘고 구름도 수여넘는 수진(길들인 매)이 날진(길들이지 않은 매)이 해동청(海東靑:송골매) 보라매 모도다 수여넘는 동설령(冬雪嶺) 고개 우리님이 왔다 허면 나는 발 벗고 아니 수여 넘으련만 어찌허여 못가는고 무정허여 아주 잊고 일장수서(一張手書)가 돈절(頓絶)헌가. 뉘여느 꼬임을 듣고 여영 이별이 되었는가 하날의 직녀성(織女星)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 일도 보건마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 물이 맥혔기로 이다지도 못 오신가 차라리 내가 죽어 삼월동풍(三月東風) 연자(燕子)되여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내가 노니다가 밤중만 임을 만나 만단정회(萬端情懷)를 풀어 볼거나 아이고 답답 내 일이야 이를 장차 어쩌꺼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울제 청삽사리 흑삽사리 컹컹짖고 나서거늘, 게 뉘랴 남의 개를 그리 짖기나?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사령군로가 나왔거날.
1)쉬어넘고
※ 가사는 김소희 창 《춘향가》(브리태니커)에서 인용.
-
의의 및 가치
갈까보다 대목은 춘향이 이도령과 함께 갔었어야 함을 한탄하는 대목이다. 몽룡을 극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여 슬픔을 배가시키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대목은 ‘mi-la-do′(si)-la’의 계면 성음으로 노래하지만 슬픔을 배가하기 위해 미(mi)에서의 떠는 음을 특히 깊이 떨며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소희, 『판소리 다섯 마당: 춘향가』, 한국브리태니커, 1982. 신은주, 「김소희제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장휘주, 「사당패소리 갈까보다 연구」, 『한국음악연구』 27, 한국국악학회, 1999.
-
집필자
김유석(金裕錫)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