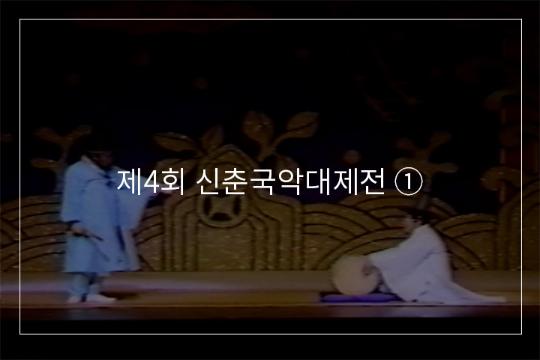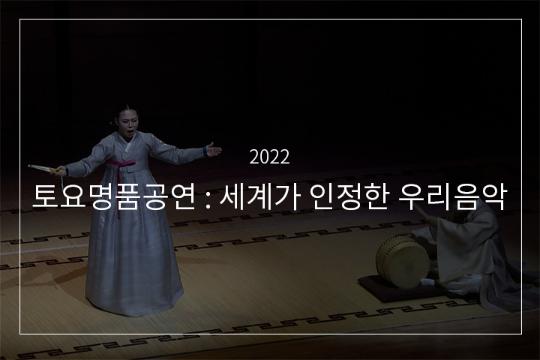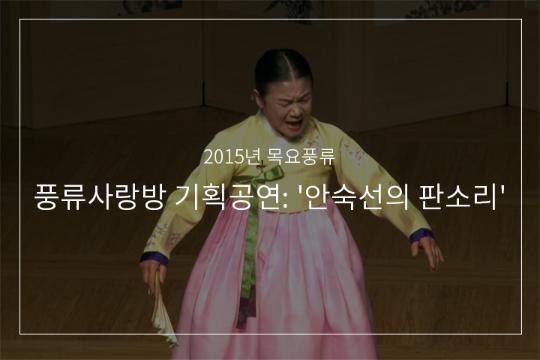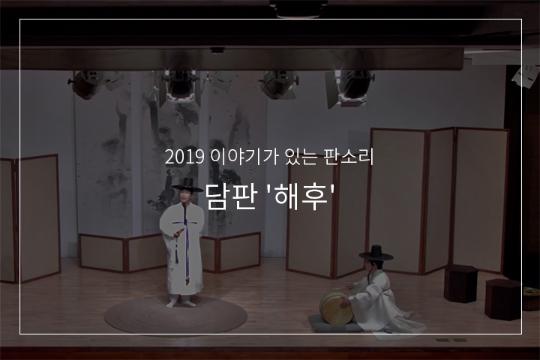-
다른 이름
어사출두(御史出頭), 암행어사 출도, 암행어사 출두
-
정의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어사로 출도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춘향을 구하는 대목
-
요약
《춘향가》 중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대목으로 변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춘향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춘향가》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므로 어느 유파에서나 전창되며 어사출를 준비하는 장면부터 이도령과 춘향이 재회하는 장면까지를 해당 대목에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 영상 이주은 창 《춘향가》 중 <어사출두>. ©국립국악원 > -
유래
해당 대목은 유진한(柳振漢,1711~1791)의 『만화집(晩華集)』에서 잔치가 벌어진 장면부터 춘향과 이도령이 한양으로 향하는 장면 속에 속하며, 현재 전창되는 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다만 어사의 수청을 들라고 춘향을 시험하는 내용이 『만화집』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열녀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정노식(鄭魯湜, 1891~1965)의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서는 임창학(林蒼鶴, 헌종과 철종대 명창)이 해당 대목을 더늠으로 구사한다고 기록하였으며, 이동백(李東伯, 1866~1950)과 정정렬(丁貞烈, 1876~1938)이 방창한 사설을 수록하고 있다.
-
내용
어사출두 대목은 횡포를 부린 변사또를 응징하고 동시에 자신의 정인(情人)인 춘향을 구해내는 이도령의 활약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다. 특히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더욱 화려하고 과장되게 그려질수록 뒤에 이어지는 어사출두 장면의 긴박감과 반전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전개되는 해당 대목은 빠른 장단 속에서 전환되는 우조와 계면조, 다양한 붙임새와 익살스러운 표현, 세밀한 동작 묘사와 다채로운 의성어 등을 통해 긴박한 장면에서 느껴지는 해학미가 돋보인다. 판소리 특유의 과장된 사설과 표현이 일망타진되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백성들의 한을 해소시키고, 정절을 지킨 춘향에게 정의로운 보상을 받는 결말로 이어진다.
-
노랫말
(자진모리) 동헌(東軒)이 들썩들썩 각청(各廳)이 뒤누울 제 본부수이각창색(本部首吏各倉色) 진휼감색(賑恤監色) 착하뇌수(捉下牢囚)허고 거행형리(擧行刑吏) 성명을 보한 연후 삼행수(三行首) 부르고 삼공형(三公兄)을 불러라 위선(爲先) 고량(庫粮)을 신칙(申飭)허고 동헌에 수례차(受禮次)로 감색(監色)을 좌정(坐定)하라 공형을 불러서 각고하기(各庫下記) 재촉(再促) 도서원(都書員)을 불러서 결총(結總)이 옳으냐 전대동색(錢貸同色) 불러 수미가(需米價) 줄이고 군색(軍色)을 불러 군목가(軍牧價) 감(減)허고 육직(肉直)이 불러서 큰 소를 잽히고 공방(工房)을 불러서 음식을 단속 수노(首奴)를 불러서 거회(巨會)도 신칙 사정(鎖匠))이 불러서 옥쇄(玉鎖)를 단속 공방(工房)을 불러 공인(工人)을 단속 행수(行首)를 불러 기생을 단속하라 그저 우군우군우군 남원성중(南原城中)에 뒤 넘는구나 좌상(座上)의 수령네가 혼불부신(魂不付身)이 되야 앉어 있들 못허고 이리 저리 다니며 서로 귀에 대고 속작 속작 남원은 절단(絶斷)이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초서리 맞기가 정녕하니 곧 떠납시다 운봉(雲峰)이 일어서며 "여보시오 본관장(本官長) 나는 곧 떠나야겄소" 본관이 겁을 내여 운봉을 부여잡고 "조금만 더 지체 하옵시오" "아니오 나는 오늘이 우리 장모님 기고일(忌故日)이라 불참하며는 큰 야단이 날 것이니 곧 떠나야겄소" 곡성(谷城)이 일어서며 "나도 떠나야 겄소" "아니 곡성은 또 웬 일이시오" "나는 초학(학疾)이 들어 오늘이 직(첫)날이라 어찌 떨리던지 시방 곧 떠나야겄소" 그때여 어사또는 기지개 불끈 "예이 잘 먹었다 여보시오 본관사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가오마는 선뜻허니 자리가 낙흥(落興)이오" 본관이 화를 내어 "잘 가든지 마든지 허제 분유헌 통에 수인사(修人事)라니 그럴 일이오?" "우리 인연 있으면 조금 있다 또 만납시다" 어사또 일어서며 좌우를 살펴보니 청패역졸(靑牌驛卒) 수십명이 구경꾼 같이 듬성 듬성 늘어 서 어사또 눈치를 살필 적에 청패역졸 바라보고 뜰 아래로 내려서며 눈 한번 꿈쩍 발 한번 툭 구르고 부채짓 까딱하니 사면(四面)의 역졸들이 해같은 마패(馬牌)를 달같이 둘러 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들이매고 사면에서 우루루루루루루루 삼문(三門)을 후다닥! "암행어사(暗行御史) 출두(出頭)야~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허옵신다~" 두 세번 외는 소리 하날이 답숙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난 듯 백일벽력(白日霹靂)이 진동(震動)하여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삼이 다 타는구나 각읍수령(各邑首令) 겁을 내어 탕건(宕巾)바람 버선발로 대숲으로 달아나며 "통인(通引)아 공사궤(公事櫃) 급창(及唱)아 탕건 줏어라" 대도(大刀) 집어 내던지고 병부(兵簿) 입으로 물고 힐근실근 달아날 적에 본관이 겁을 내어 골방으로 달아나며 통인의 목을 부여 안고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통인아 날 살려라" 혼불부신이 될 적에 역졸(驛卒)이 장난헌다 이방(吏房) 딱! 공방형방(工房刑房) 후닥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삼대독신이오 살려주오 어따 이 몹쓸 아전 놈들아 좋은 벼슬은 저희가 다 허고 천하 몹쓸 공방 시켜 이 형별이 웬 일이냐" 공형 아전(工刑 衙前) 갓철대가 부러지고 직령동이 떠나갈 적 관청색은 발로 채여 발목 삐고 팔 상한 채 천둥지둥 달아날 적에 불쌍허다 관노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엎어지고 덜미치고 상투 쥐고 달아나며 "난리 났네" 깨지나니 북 장고요 뒹구나니 술병이라 춤 추던 기생들은 팔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官婢)는 밥상잃고 물통 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공방(工房)은 자리 잃고 멍석 말아 옆에 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워따 이 제기럴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령(使令)은 나발(喇叭) 잃고 주먹 쥐고 "홍앵~ 홍앵" 운봉은 넋을 잃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가며 "어따 이 놈의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 가고 남원성중으로만 부드등 부드등 들어가니 암행어사가 축천축지법(縮天縮地法)을 하나부다" "헌화금(헌譁禁) 하랍신다" "쉬이~"
안숙선 창 <어사출도> 『안숙선 춘향가』, 이엔이 미디어, 2003
-
의의 및 가치
해당 대목은 《춘향가》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 부분으로 탐관오리의 횡포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민중들의 의식을 비롯해 정절을 명분으로 변사또에게 저항하는 춘향의 모습이 매우 극적으로 그려져 있다. 단순히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겪었던 부조리한 현실과 부정부패에 대한 응징이 음악 예술로 승화되어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판소리의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
지정사항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1964)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걸작(2003)
-
참고문헌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문학과 언어』 12, 한국문화융합학회, 1991. 김진영ㆍ김동건ㆍ김미선, 『김수연 창본 춘향가』, 이회문화사, 2005. 윤석준, 「춘향가 어사출도 대목의 전승과 변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집필자
정진(鄭珍)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