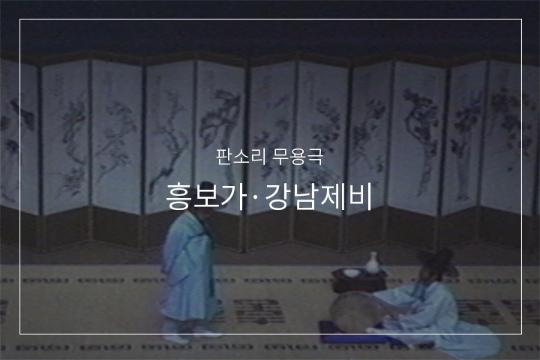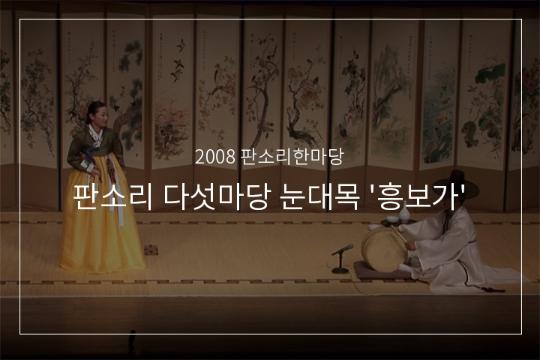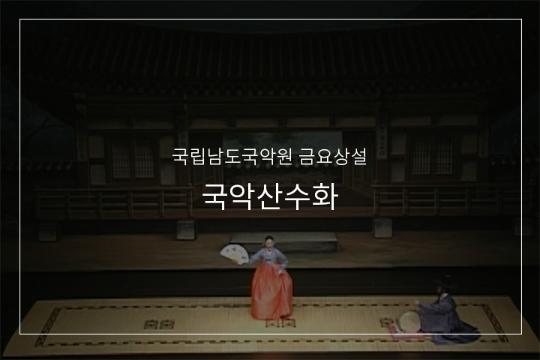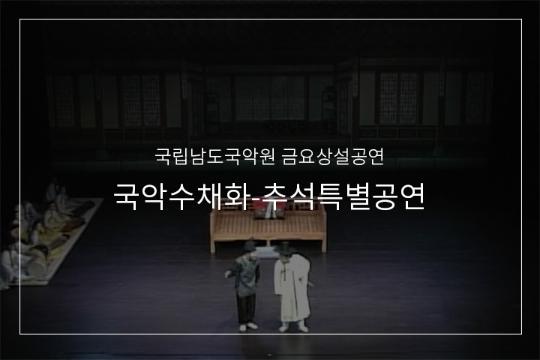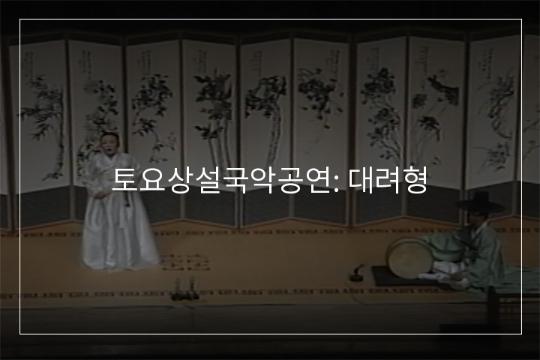-
다른 이름
화초장 대목
-
정의
-
요약
화초장타령은 부자가 된 흥보집에 놀보가 찾아가 심술을 부리며 잘 대접을 받고 화초장 하나를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노래로 부른 것이다. 온갖 보화가 가득한 화초장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부르지만 결국은 잊어버리고 만다. 중중모리장단에 전형적인 계면조 악조로 되어있는데 요성과 꺾는목의 사용이 절제된 평계면으로 경쾌하고 흥겹게 부른다. 화초장타령은 판소리의 언어유희적이고 골계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
유래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 대목은 놀보가 동생 흥보에게 화초장을 얻고 흥겹게 돌아가는 재담적 성격이 강한 대목이다. 이전의 문헌이나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고 1941년 발매된 창극 〈흥보전〉 음반(Okeh 20095-K1648)에서 처음 볼 수 있어 최근에 만들어진 대목이다. 오케판 창극 <흥보전>에서는 화초장타령을 오수암, 임방울, 이화중선이 분창형식으로 녹음했다. 그 외에 박록주, 박봉술, 강도근, 김연수 등 많은 창자들의 음원이 남아 있다.
< 단막창극 《흥보가》 중 화초장대목 ©국립국악원 >
-
내용
화초장타령 대목은 놀보가 화초장을 지고 가며 ‘화초장’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사설이다. 이 대목은 형제의 우애를 내세워 동생의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 놀부의 욕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놀보가 ‘화초장’을 메고 가며 또랑을 건너뛰다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화’, ‘초’, ‘장’이라는 세 글자를 이리저리 붙여보고, ‘장’자 돌림이 붙은 물건을 나열하여 이름을 기억해 내려고 한다. 이 대목은 판소리의 희극적이고 언어유희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말놀이를 이어간다. 화초장 대목은 판소리 특유의 말놀이와 골계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라는 이유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박록주의 화초장 대목은 아니리 대목과 마찬가지로 골계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소거하여 간결한 내용 전달만 함으로서 다른 창자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화초장타령 대목은 중중모리장단에 구성음은 미(mi)-솔(sol)-라(la)-시(si)-도(do′)-레(re′)의 계면조 구성음이나 계면의 슬픈 느낌으로 부르지 않고 꿋꿋하고 밝은 우조와 흥겨운 분위기의 평조성음 곡조로 부른다. 주선율은 동음반복 선율과 도약 진행하고 떠는 목, 꺾는 목의 시김새가 약하게 나타난 평계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초장타령 대목에 사용된 중중모리장단은 열두 개의 소박이 세 개씩 묶여 네 박을 이루는 3소박 4박자로 되어 있다. 주로 각 박의 제1소박에 가사가 붙는 대마디대장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장단이 네 박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유미리 창 《흥보가》 중 ‘화초장대목’ ©국립국악원 >
-
노랫말
《흥보가》중 화초장타령 대목은 언어적 유희가 뛰어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놀보가 ‘화초장’ 세 글자를 외면서 지고 가다가 화초장이란 말을 잊어버린 후 기억을 되돌리기 위하여 ‘장’자 돌림이 붙은 물건들을 나열하는 희극적인 장면이다. 《흥보가》중 오케판 興甫傳(唱劇)의 사설과 동편제 《흥보가》를 이어받은 박송희 명창의 사설을 소개한다. 1. 오케판 興甫傳(唱劇) 화초장타령 (아니리) 오수암 ; “홍보야!” 임방울 ; “예.” 오수암 ;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장개드려 주마. 홍보야!” 임방울 : “예.” 오수암 ; “니 소식올 들으니, 니가 제씨 땀에 잘 되었다니 정말이냐?” 임방울 ; “예, 그리 되었습니다.” 오수암 ; “들어 가자.” 임방울 ; “예.” 오수암 : “그리고 흉보야!” 임방울 ; “예.” 오수암 ; “너 저것 나 도라.” 임방울 ; “예, 가져 가십(시요).” 오수암 ; “이것 이름이 무엇이냐?” 임방울 ; “화초장이올시다.” 오수암 ; “화초장이여?” 임방울 ; “예.” 놀보가 화초장을 딱 짊어지고 건네 가면서 외고 가는데 이런 가 관이 없것다. (중중머리) 오수암 :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이로구나. 아니다 내가 잊었다. 초장 간장 된장? 아니다‘ 장화초? 아나다. 장화초 아니다. 임방울 ; 저의 집으로 들어간다, 오수암 ;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 루루루 달려들 어 영접허는 게 도리가 옳제, 이 사람 자네가 가만히 앉아 좌이대사자 웬일인가?” 이화중선 ;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되얐소 이리 오시요, 이리 오라면 이리와.”
[출처]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 사설(5)-오케판 흥보전(창극)」,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20.
2. 박송희唱 화초장타령 (아니리) " 그런디, 저 웃목에 있는게 뻘건 것이 뭣이냐?" "화초장(花草匠)이올시다." "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들었습지요" " 그것 날도라." " 글안해도 형님 드릴라고 은금보화 담뿍 넣서 제직해 놨습니다." "이리 내 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내일 하인에게 지어 보낼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에이 씨식잖은놈, 나 간 뒤에 좋은 보물은 다 빼내고 빈 궤만 보낼라고? 아니다 매사는 불여튼튼이라 허였으니 내가 그냥 손수 짊어지고 갈란다. 이리 내 놔라."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외고 가는디, (중중머리)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 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 허는게 도리가 옳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놀보 마누래 나온다. 놀보 마누래 나와. "영감 오신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와"
[출처]채수정,『박송희 판소리 ‘흥보가’ 악보집』, 민속원, 2014.
< 김수연 창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국립국악원 > -
의의 및 가치
《흥보가》 화초장 대목은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외우며 집으로 돌아가는 대목이다. 골계적이고 해학적인 판소리 사설 구성에 중중모리장단의 흥겨운 장단과 평계면 선율로 짜여있다. 흥보가의 대표적 재담 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지정사항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유산(1964)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03)
-
참고문헌
강한나, 「동편제 흥보가 화초장타령의 바디별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현주, 「박초월 《흥보가》의 계면길 음구조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 사설(5)-오케판 흥보전(창극)」,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20. 백대웅, 「판소리와 산조의 우조ㆍ평조ㆍ계면조」,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 어울림, 2004. 조아라, 「박송희와 정순임의 《흥보가》 비교 연구」, 『한국문헌학』 11, 한국음악문헌학회, 2020.
-
집필자
정수인(鄭琇仁)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