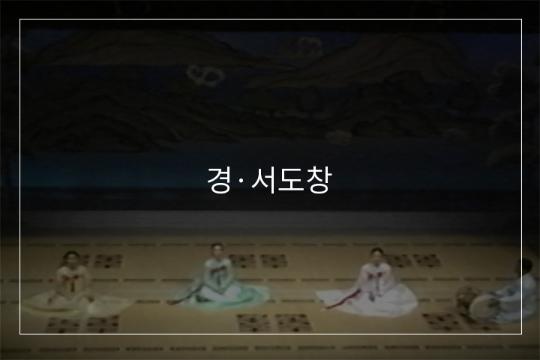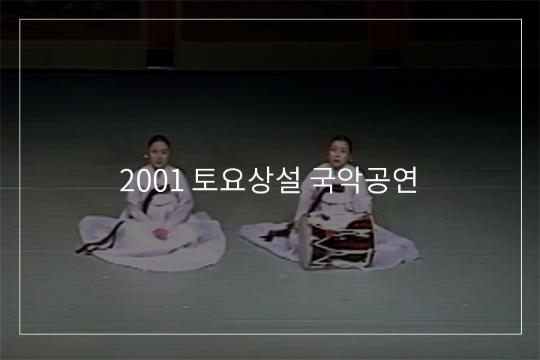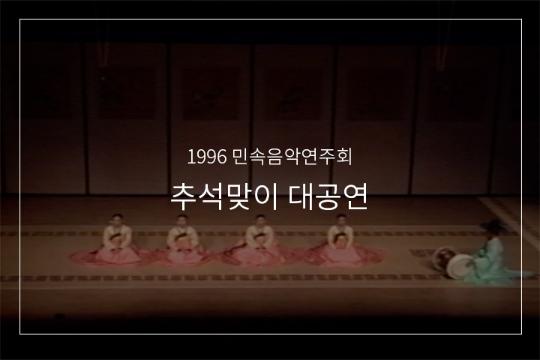-
다른 이름
월령가(月令歌) -
정의
<사친가>, <적수단신가>, <매화타령> 등 서로 다른 내용의 세 가지 노래가 합쳐진 십이잡가. -
요약
달거리는 전문예인집단에서 유희나 수련을 위해 부르던 노래로 서로 다른 내용의 <월령가>, <적수단신가>, <매화타령>이 합쳐진 노래이다. 20세기에 완성되었으나 귀에 익고 반복적인 곡조와 이해하기 쉬운 사설로 12잡가 중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매화타령>의 인기에 더불어 전국적으로 전파된 잡가이며, 서울·경기지역의 사투리와 경토리로 표현되는 12잡가의 대표곡이다.
< 달거리 ©국립국악원 > -
유래
달거리는 경기 12잡가 중 하나로, 〈사친가〉·〈적수단신가〉·〈매화타령〉 세 곡이 결합된 구성이다. 앞부분 〈월령가〉는 〈사친가〉에서 유래하며 월령체 형식으로 정월부터 삼월 절기를 담는다. 중간은 〈적수단신가〉(경산타령), 후반은 〈매화타령〉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매화’는 기명(妓名)을 뜻한다. 전통민요였던 매화타령이 달거리에 편입되며 통합형 잡가로 정착하였다. -
내용 및 구성
○ 연행 시기 및 장소 달거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애창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잡가 중 가장 대중적인 곡이다. 주로 민간의 유희 장소나 겨울철 파움 등에서 불렀다고 한다. ○ 음악적 특징 세 노래 조합형의 달거리의 음계는 각각의 음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경토리의 음 조직을 갖추고 있다. 달거리를 구성하는 음계는 ‘솔(sol)-라(la)-도(do′)-레(re′)- 미(mi′)-솔(sol′)-라(la′)’이며 중심음은 도(do′)이다. 달거리의 <월령가>와 <매화타령> 부분은 도(do′)에서 솔(sol)로 하행종지하며, <적수단신가>는 중심음 도(do’)로 평행종지한다. 달거리에는 음의 앞뒤로 여러 음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휘감는 듯한 느낌을 주는시김새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경토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시김새이다. 달거리는 ‘세마치장단’, ‘6박장단’. ‘굿거리장단’ 장단으로 구성되어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장단의 변화와 함께 독특한 말부침을 보인다.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부분마다 서로 다른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 “네가 나를 볼 양이면~”으로 시작되는 〈월령가〉 부분은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으며 정월부터 삼월까지의 사설만 부른다. “이 신구(新舊)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군(일조郎君)이 네가 내 건곤(乾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로 되어있는 후렴구 사설의 원래 의미는 “이 친(親)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낭군(일조郎君)이 네가 내 건곤(乾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라는 뜻이며 언어유희를 보여주는 후렴구는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잡가 중에서 격이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적수단신가〉의 후렴은 “나하아에 지루에 에도 산이로구나.”로 별다른 의미는 없는 입타령조의 후렴이다. 〈매화타령〉부분의 후렴은 누구나 들으면 따라 할 수 있는 단조로운 곡조에 매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불러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형식과 구성 《12잡가》 달거리를 달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 시작 부분이 ‘달거리 형식’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달거리 형식’의 노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에 따라 사설을 붙여서 부른 형식의 노래를 이르는 말로 흔히 달거리 또는 〈월령가(月令歌)〉라고 한다. 그런데 《12잡가》달거리의 경우는 12달의 노래가 모두 있지는 않다. 달거리 앞부분에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의 세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설은 조선시대 작자⋅연대 미상의 내방가사로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며 읊은 월령체(月令體)의 내방가사 〈사친가(思親歌)〉의 일부이다. 〈사친가〉에는 12달의 노래가 모두 있으나 《12잡가》 달거리는 그 중 앞의 세 달의 노래만을 차용했으며, 그 내용도〈사친가〉의 각 월령의 앞부분 몇 구절만 있다. 달거리의 두 번째 사설 부분은 〈적수단신가〉인데 “적수단신(赤手單身) 이내 몸이”부터 “나하에 지루에도 산이로구나”까지 부분이다. 〈적수단신가〉는 〈경산타령〉이라고 불리며 〈경산타령〉을 〈매화타령〉과 함께 부를 땐 곡명을 달거리라고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두 번째 사설 부분은 〈적수단신가〉또는 〈경산타령〉이라는 제목으로 《12잡가》달거리 이전부터 불렸었다. 세 번째 사설 부분은 <매화타령>인데 “좋구나 매화로다∼”부터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도로다”까지를 노래 부른다. <매화타령>은 <매화가>라고도 불린다. <매화타령> 부분은 12가사 중의 하나인 <매화가(매화타령)>과는 완전히 다른 노래이다. 달거리는 유절형식이며 11마루로 〈월령가〉4마루, 〈적수단신가〉3마루, 〈매화타령〉4마루로 되어있으며 《12잡가》에서 상행종지, 하행종지, 평행종지의 모든 종지 형태가 나타나는 유일한 곡이다. 세 노래 조합형인 달거리의 종지음과 종지형태는 변화가 많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잡가를 부르는 창자의 모습이 정적인 것과 대비된다. 달거리는 잡가 중에서도 민속 음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즉흥성과 유연성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잡가는 독창자와 장구 반주만으로 단조롭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 명의 창자가 함께 부르기도 하고 반주 악기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한다. 특히 달거리는 뒷부분에 매화타령이 있어서 반주를 수반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반주 악기로는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장고 등이 사용되며 그 외의 악기를 편성하기도 한다. -
노랫말
네가 나를 볼 양이면 심양강 건너와서 연화분에 심었던 화초 삼색도화 피었더라.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군이 네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 정월이라 십오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망월도 하려니와 부모봉양 생각세라.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군이 네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 이월이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적막이로다 개자추의 넋이 로구나 면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 속잎이 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군이 네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 삼월이라 삼진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 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군이 네가 내 건곤이지. 아무리 하여도 네가 내 건곤이지. 적수단신 이내 몸이 나래 돋친 학이나 되면 훨훨 수루루룩 가련마는. 나하아에 지루에 에도 산이로구나. 안올림 벙거지에 진사상모를 덤벅 달고 만석당혜를 좌르르르르 끌며 춘향아 부르는 사람의 간장이 다 녹는다. 나하아에 지루에 에도 산이로구나.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 낙동강이 둘러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뒤치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 금강이 다 둘러 있다. 나하아에 지루에 에도 산이로구나. 아하-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인간이별 만사중에 독수공방이 상사난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안방 건너방 가루닫이 국화새김에 완자무늬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슨 염치로 삼승 버선에 볼 받아 달라느냐.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나무로 치며는 행자목 돌로쳐도 장군석 음양을 쫓아 마주섰고 좌펑룡 우백호 한가운데는 신동이 거북의 잔등이 한나비로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 나돌아감네 나돌아감네 떨떨거리고 나돌아 가누나.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이창배,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54, 83쪽. -
의의 및 가치
달거리는 〈사친가〉, 〈적수단신가〉, 〈매화타령〉이 결합된 복합형 잡가로, 전통 민요와 성악곡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사적 가치를 지닌다. 월령체 사설은 조선 내방가사의 효 사상을 담고 있으며, 개인적 정서와 시대 윤리를 잡가의 표현 안에 통합시킨다. 〈적수단신가〉는 삶의 고단함과 현실 감각을 보여주며, 민요적 체험이 구술 방식으로 반영된다. 후반부 〈매화타령〉은 당시 유흥문화와 대중적 미감을 보여주며, 꽃이 아닌 기명(妓名)을 의미하는 매화를 통해 풍속과 감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달거리는 이처럼 다양한 가창 양식과 서정적 내용을 포괄하며, 민속예술의 변형과 잡가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민요』, 민속원, 2008. 김영운, 『한국민요학』, 한국민요학회, 2002. 성경린 외, 『국악의 향연』, 중앙일보사, 1988. 송은주, 『12잡가의 시대적 변화양상 연구』, 민속원, 2016. 송은주, 『십이잡가, 우리의 삶과 자연의 노래』, 민속원, 2020. 이창배,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54.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4. -
집필자
송은주(宋銀珠)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