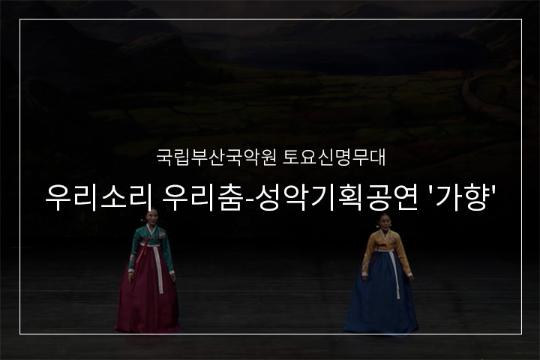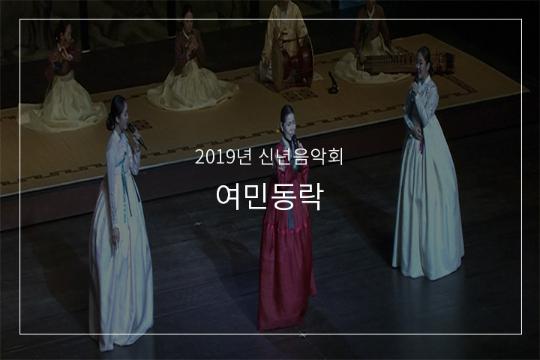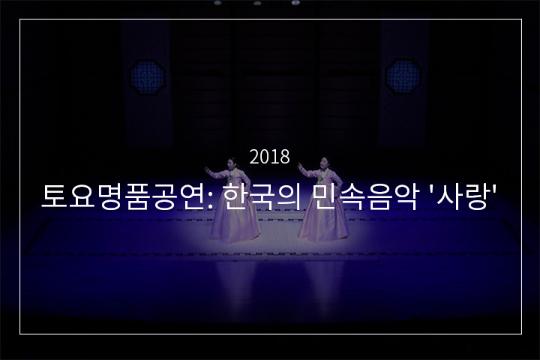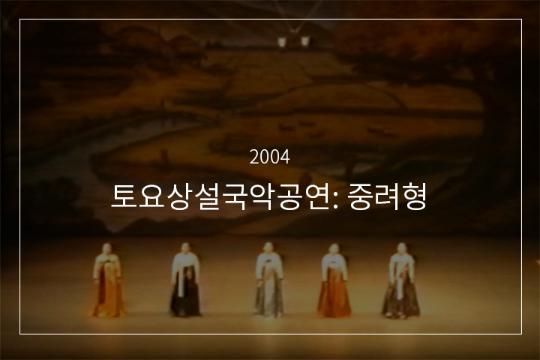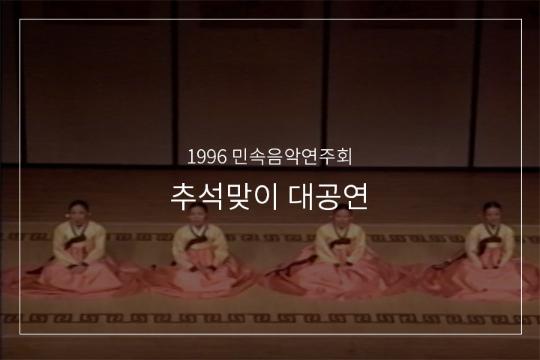-
정의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통속민요 중의 하나
-
요약
-
유래
매화타령은 본래 경기 좌창인 긴잡가(12잡가) 중 〈달거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달거리〉는 팔잡가와 잡잡가로 구성된 12잡가 중 잡잡가에 해당하는 악곡으로, 〈월령가〉・〈적수단신가〉・〈매화타령〉 등의 세 노래가 합쳐진 것이다. 이 중 후반부에 부르는 매화타령이 독립적으로 불리면서 민요 〈매화타령〉이 된 것이다. 즉 〈달거리〉의 마지막을 여미는 매화타령을 구성하고 있는 사설이나 선율의 대부분이 여타의 통속민요들과 같이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는 경기명창들의 주요 연주곡목 중의 하나로 매화타령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경기 통속민요 매화타령은 과거의 전통 시대 유랑예인집단인 사당패들이 부른 노래로, 경기 사당패들이 불렀던 매화타령을 바탕으로 20세기 초에는 선율이나 시김새가 단순하였지만, 이후 대중적인 통속민요로 거듭나면서 세련성이 더해지고 양식화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민요 매화타령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 불리게 되었는지 확실한 문헌적 근거는 입증되지 않지만, 사설이나 선율이 〈달거리〉의 후반부와 거의 유사하며, 매화타령이라는 곡명 역시 후렴 사설에 “좋구나 매화로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기 긴잡가 <달거리> 여미는 부분의 <매화타령>. ©국립국악원 >
<매화타령>이 음반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896년 미국 여성 인류학자인 엘리스 플레처가 녹음한 에디슨 원통형 음반이다. 이 음반에는 현재의 <매화타령> 후렴구의 사설인 ‘좋구나 매화로구나‘라고 하는 사설의 노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화타령>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것과는 음악어법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미 <매화타령>이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이후 20세기 초 유성기음반에는 박춘재와 김홍도가 부른 12잡가 중 <달거리>에 포함되는 <적수단신가>, 즉 <경산타령>과 <매화타령>을 수록한 음반이 있다. 이외에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으로 녹음된 것, 남도명창이 녹음한 것, 경서도명창들이 녹음한 것 등 다양한 음반이 18면정도 있다. 특히 콜럼비아음반 중에는 신민요로 분류되어 있으며, 김낙천 작사, 김기방 작곡의 <신매화타령>이 2면 보이는데, 이것은 양악기 반주에 맞춰 연주한 것들이며, 사설은 현재와 같은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행 <매화타령>은 유성기음반 자료들과 사설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마 민중들 사이에서 불린 것을 전문음악인들이 기존의 사설을 다듬기거나 새로운 사설을 첨가하고, 그들이 부른 기본적인 선율에 장식음이나 시김새를 첨가하여 세련성 있게 다듬어 감상용의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
내용
최초의 한국음악을 녹음한 음반에 수록된 두 곡의 매화타령은 떠는 음과 꺾는 음이 출현하는 바, 남도 지방 음악어법으로 되어 있다. 현행 경기민요로 분류되는 매화타령은 ‘솔(Sol)-라(la)-도′(do′)-레′(re′)-미′(mi′)’의 5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음 중 특정한 한 음을 요성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순차 진행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곡을 끝맺을 때에는 경기 지방의 음악어법과 같이 하행선율로 진행하면서 음계의 최저음인 ‘솔(sol)’로 종지하는 진경토리에 해당한다. 장단은 3소박 4박자의 굿거리장단이며, 일반적으로 네 장단 본 절을 부른 후 네 4장 후렴이 따르는 유절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절은 가사의 따라 두 장단에서 넷 혹은 다섯 장단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등 길이가 자유롭다.
< 경기민요 <매화타령>. ©국립국악원 > -
노랫말
일반적으로 유절형식의 민요들에서 후렴은 하나의 사설과 선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화타령의 후렴 사설은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더야 어허야 에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와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더야 어허야 에 두견이 울어라 좋구나 매화로다”의 두 가지가 있다. 즉 끝 부분의 사설이 “디여라 사랑도 매화로다”와 “두견이 울어라 좋구나 매화로다”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이 곡 본 절의 사설은 악곡명과 달리 통속민요의 보편적인 사설 내용인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창배(李昌培, 1916~1983)의 『한국가창대계』에 의하면, 이 곡 본 절의 사설이 몇 개 되지 않아 본인이 작사하여 29절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매화타령의 1절과 2절은 유성기음반 시절과 동일한 사설이지만, 이후 부분은 12잡가 중의 〈방물가〉나 〈변강쇠가〉에서 빌려온 내용과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내용들로 작사된 것들이다.
1896년 『한민족 최초의 음원』
(후렴) 에야데야 에헤야 에이여라 지경이로다 아 좋구(나) 매화로다 1. 지리산 저리(가루)산 동구밖에 우두커니 섰는 저장승 진다 모두가 지경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2. 세월아 네월아 가지마라 장안 호걸이 다 늙는다 좋구나 매화로다
Columbia40137-A 경기민요 매화타령 박월정 김인숙
(후렴)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에헤이요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1. 인간이별 만사 중 독수공방이 상사더니라 좋구나 매화로다 2. 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새김이 완자문이라 좋구나 매화로다 3. 동네 집 가는 걸 말을 말고 배운대 꼭대기 집지어 살구나 사랑도 매화로다 4. 연극장 가는 걸 말을 말고 유성기 한판을 들여다 주려마 좋구나 매화로다 5. 나 돌아간다 어 나 돌아간다 떨떨거리고 나 돌아가누나 사랑도 매화로다 (후략)
Columbia40657-A 신민요 신매화타령 유개동 장경순
얼시구 매화로다 에야듸야 에헤야 에헤듸헤로 내사랑 매화로다 1. 매화두고 매즌인연 백년기약이 매화로구나 조코나 매화로다 (후렴) 에야듸야 에헤야 에헤루듸헤로 내사랑 매화로다 2. 매화ᄭᅩᆺ이 우스면은 내님도 웃는 매화로구나 조코나 매화로다 3. 매홧곳을 ᄭᅥᆨ지마라 님이 사랑둔 매화로구나 조코나 매화로다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후렴)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더야 어허야 에- 두견아 울어라 좋구나 매화로다 1.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난(想思難)이란다 2. 안방 건넌방 가로닫이 국화(菊花) 새김의 완자문이란다 3. 어저께 밤에도 나가 자고 그저께 밤에도 구경가고 무삼 염치(廉恥)로 삼승(三升)버선에 볼받아 달람나 4. 나무로 치면은 행자목(杏子木), 돌로 쳐도 장군석(將軍石) 음양(陰痒)을 좇아 마주 섰고 좌 청룡(左 靑龍)우 백호(右白虎) 한가운데는 신동(神童)이 거북의 잔등이 한 나비로다 5. 나 돌아감네 에에헤 나 돌아감네. 떨떨거리고 나 돌아가노라 6. 지리산(智異山) 가루산 동구(洞口)밖에 우두머니 섯는 장승 사모품대(紗帽品帶)를 하였구나 엄동설한(嚴冬雪寒) 모진바람 사시장천(四時長天) 긴긴날에 무엇을 바라고 우뚝이 섰느냐 7. 용장봉장(龍欌鳳欌)여닫이 자개 함롱 반닫이 각계수리 들미장 샛별 같은 놋요강이로다 8. 천하의 잡놈은 변강쇠 천하 잡놈 변강쇠. 매일장취(每日長醉) 술만 먹고 집안에 들면 계집 치고 나가면은 쌈질만 하고 나무를 해 오라면 장승만 빼 온다 9. 도리화(桃李花) 두견화(杜鵑花) 영산홍(映山紅) 백일홍(百日紅) 흑국(黑麴) 백국(白菊) 계관화(鷄冠花) 월중단계(月中丹桂) 무상경(無上景) 달 가운데 계수(桂樹)로구나 10. 팔월부용(八月芙蓉) 군자용(君子容) 만당추수(滿堂秋水) 홍련화(紅蓮花) 암향부동(暗香浮動) 월황혼(月黃昏) 소식 전턴 한매화(寒梅花)로다 위의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의 사설 중 1절과 2절ㆍ5절 등은 예전부터 부르던 가사였으며, 4절은 〈달거리〉, 7절은 〈방물가〉, 6절과 8절은 〈변강쇠가〉에서 빌려온 내용이다.
-
의의 및 가치
<매화타령>은 통속민요 가창자와 동일 집단에 의해 불리는 잡가 <달거리>의 후반부를 바탕으로 세련성 있게 다듬어 감상용의 민요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통속민요는 대부분 유절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렴에 해당하는 사설과 선율은 하나의 유형이나 <매화타령>의 후렴에는 두 개의 유형이 나타난다. 현재 후렴 처음에 부르는 ‘좋구나 매화로다’는 원래 본 절의 끝부분에 독창으로 불리던 것이었다. 또한 독창의 본 절은 사설에 따라 굿거리 장단 두 개에서 넷 혹은 다섯 개까지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후렴은 굿거리 장단 넷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 경기명창인 이창배에 의해 본 절의 사설이 <변강쇠가>나 <발물가> 등에서 차용하거나,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창작되어 예전에 비해 풍부해졌다. 밝고 화사하며 경쾌함을 악곡 내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어, 경기민요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악곡이다.
-
참고문헌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임정란 편저, 『경기소리대전집 (下)』, 도서출판 무송, 2001.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엮음, 『한국유성기음반』, 한걸음더, 2011. 손인애, 「경기 통속민요 〈매화타령〉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2010.
-
집필자
이윤정(李侖貞)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