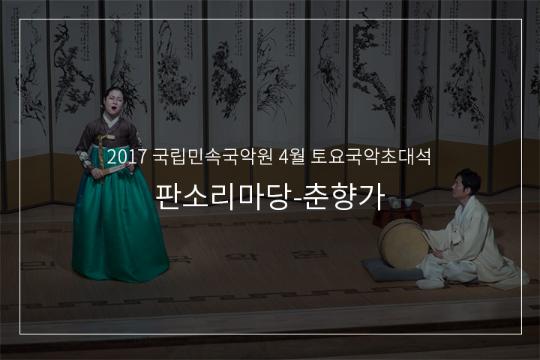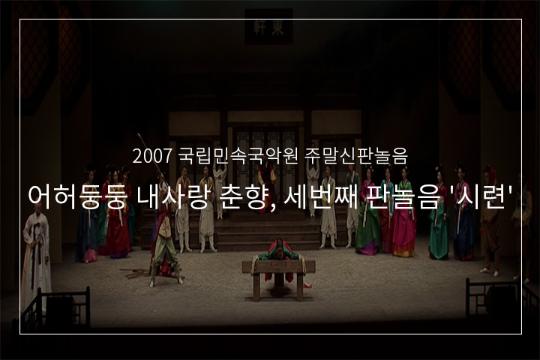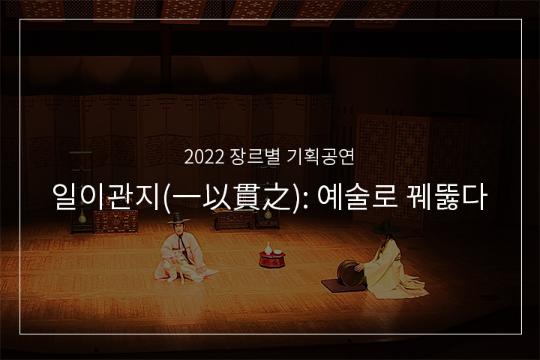-
정의
《춘향가(春香歌)》 중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매를 맞으며 이도령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하는 대목
-
요약
-
유래
십장가는 유진한(柳振漢, 1711~1791)의 『만화집(晩華集)』에는 등장하지 않아 후대에 첨가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를 통해 염계달과 조기홍의 더늠임을 알 수 있으며, 그중 조기홍의 더늠으로 알려진 십장가는 현재 전승되는 십장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전승되는 대부분의 창본에서 십장가를 부르는데 경기12잡가 중 〈십장가〉ㆍ〈집장가〉ㆍ〈형장가〉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내용
○ 역사적 변천 과정 십장가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남원고사(南原古詞)』 계열은 춘향이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완판본』 계열은 정절을 강조하는 당대 윤리 의식과 신분제의 모순 및 탐관오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부각되어 있다. 현재 창본은 『완판본』 계열의 십장가와 유사한데 매를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며 변사또에게 저항하는 춘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승 계보에 따라 십장가의 구성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김세종제인 조상현과 성우향의 사설은 『옥중화』 계열과 동일하고, 정정렬제인 김여란ㆍ김연수ㆍ김소희는 변사또와 춘향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창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형태이다. 한편 『남원고사』 계열의 십장가는 춘향이 곤장을 맞기 전 변사또에게 저항하는 부분이 등장하여 창본의 사설보다 내용 면에서 매우 확대된 구성을 보인다. ○ 형식 및 구성 십장가는 전개되는 장면에 따라 집장사령이 형을 준비하는 부분(‘집장사령…’), 열 대의 곤장을 맞으며 춘향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는 부분(‘매우 치라…’), 형장이 끝난 후 춘향의 처참한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열을 치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춘향이 열 대의 곤장을 맞는 부분은 주인공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다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묘사하므로 해당 부분의 사설은 창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그려진다. 따라서 열 대 혹은 그 이상의 곤장을 맞으며 춘향이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노래로 부르는 형태도 존재하지만 이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두 대의 곤장으로 사설을 구성하는 집약적인 형태도 존재한다. 또한 김연수 창본의 경우 십장가를 춘향과 변사또의 대화체로 구성하여 창극적 요소를 강조하는 등 바디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십장가를 부른다. 다양한 가감 형태로 전창되지만 주인공의 고난이 가장 극대화되는 대목이므로 대부분의 바디에서는 해당 대목을 생략하지 않고 전창한다. ○ 음악적 특징 십장가는 전개되는 장면에 따라 악조 및 장단의 사용이 변화되는데 춘향이 곤장을 맞는 부분까지는 계면조와 진양조장단이 중심을 이루고,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모리와 중중모리장단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아니리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
노랫말
십장가의 사설은 전승 계보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김세종제와 정정렬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두 바디 모두 진양조와 중모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집장사령’ 대목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차이가 있고, 정정렬제에서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김세종제에서는 진양조로 불리는 등 음악적 구성에서도 변별된다. (진양조) 집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장 한 아름을 덤쑥 안어다가 동틀 밑에다 좌르르르르르르 펼쳐 놓고, 형장을 고르는구나. 이 놈도 잡고 느끈능청, 저 놈도 잡고 느끈거려, 그 중에 등심 좋은놈 골라 쥐고, 사또 보는 디는 엄명이 지엄허니, 갓을 숙이어 대상을 가리고 춘향다려 속말을 헌다. “이애,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넘겨치마. 꼼짝꼼짝 말어라. 뼈 부러지리라.” “매우 치라.”“예이.” “딱!” 부러진 형장 가지는 공중으로 피르르르르르르르 댓돌 우에 떨어지고, 동틀 우에 춘향이는 토심스러워 아프단 말은 아니 허고 고개만 빙빙 두루며,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허랴는디, 일개형장이 웬말이오? 어서 급히 죽여주오.” “매우 치라.” “예이.” “딱!” “둘이요.”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적 을 알었거든 두 낭군을 섬기리까? 가망없고 무가내오.” (이하 생략)
김수연 창 〈십장가〉 『김수연 춘향가』, 국악방송·악당이반, 2006.
(중모리) 집장사령 거동 보아라. 형장 한아름을 담쑥 안어다가 형틀 앞으 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 펼떠리고 형장을 들어서 고르는구나. 이놈도 잡고 느끈능청 저놈도 잡고 느끈능청, 손잽이 좋은 놈 골라잡고, “춘향아, 한 두 낱만 견디면은 내 솜씨로 살려주마.” “형추하라” “형추혀” (진양조) “매우 쳐라.” “예이.” 딱, 때려 놓으니, 부러진 형장 가지는 공중으로 피르르르르르르르 대뜰 아래 떨어지고 춘향이는 기절허여, “음” “일향 훼절 아니허리?” “훼절이오? 훼절이 무엇이오? 일조 낭군 이별후으 일부종사 헐라는디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시 시각으 변허리까? 가망 없고 못허지요.” “매우 치라.” “예이.” “딱!” “둘이요.”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적을 알었거든 두 낭군을 섬기리까? 가망없고 무가내오.” (이하 생략)
최승희 창 십장가 『최승희 춘향가』, KBS미디어·(주)이엔이미디어, 2005.
-
의의 및 가치
해당 대목은 《춘향가》에서 비장미와 긴장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후대로 오면서 판소리의 극적 완성도와 확장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향 개인의 감정을 매우 사실적이고 긴장감 있게 그려내는 부분과 계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표현, 나아가 남성과 여성 창자들이 해당 대목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판소리가 가진 음악 예술의 다양한 면들이 잘 드러난다.
-
지정사항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유산(1964)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걸작(2003)
-
참고문헌
김진영ㆍ김동건ㆍ김미선, 『김수연 창본 춘향가』, 이회문화사, 2005.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0. 최승희, 『정정렬제 판소리 춘향가 악보집』, 두인기획, 2001. 김동건, 「십장가 대목의 전승과 변이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51, 2009. 서유석, 「춘향전 십장가 연구-춘향 항거 의미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 2009. 서정민, 「김세종제와 정정렬제의 《춘향가》 중 〈십장가〉 비교연구: 김수연ㆍ최승희의 사설 및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양지인, 「여성 고난 대목을 통한 여창 판소리의 여성성 구현 -《춘향가》 중 〈십장가〉, 〈옥중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65, 2020. 전계영, 「염계달 소리의 존재 양상 및 사설의 특징」, 『어문논총』 84, 2020.
-
집필자
정진(鄭珍)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