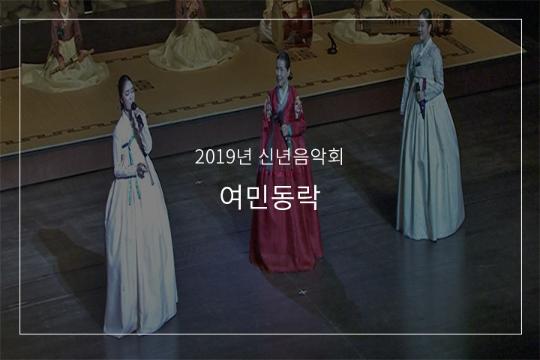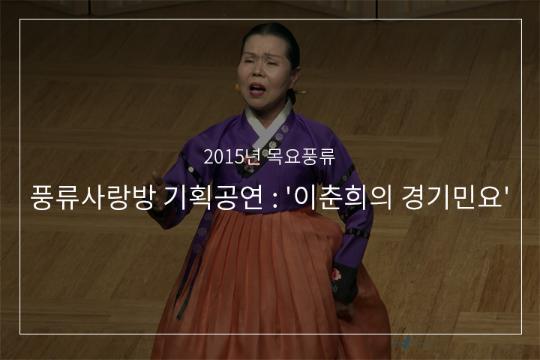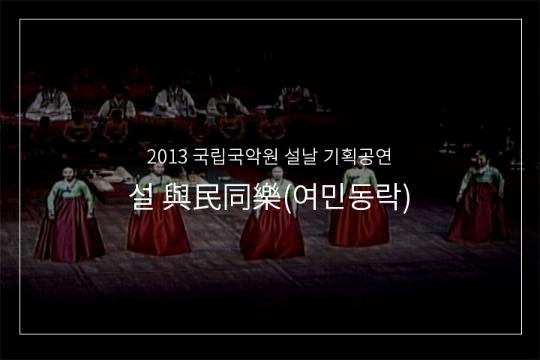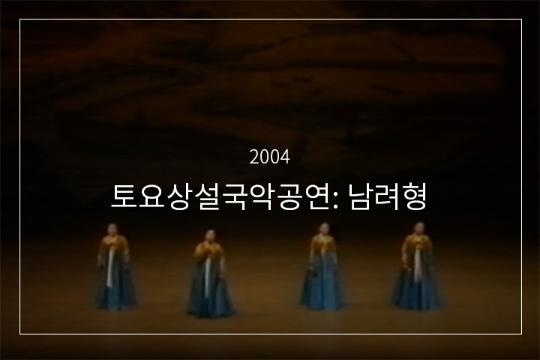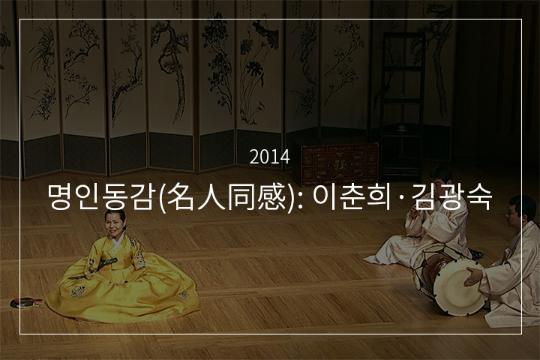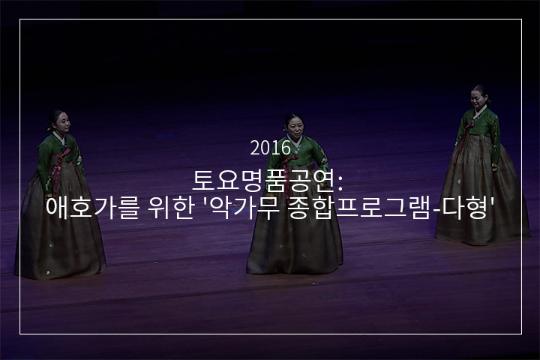-
다른 이름
무녀유가, 무당노래, 무녀가 -
정의
서울 및 경기지역 무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시조와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통속민요. -
요약
노래가락은 서울ㆍ경기지역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가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통속화된 민요이다. 노랫말과 장단에 시조와의 관련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무대 음악으로 연행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서울 및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통속민요 중 하나다. -
유래
-
내용
○ 역사적 변천과 전승 노랫가락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굿에서 신을 청할 때(청배)와 신과 대화(공수)한 다음에 부르는 무가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반주하는 악기들에 의해서 무악으로도 연주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기생 또는 전문 소리꾼이 라디오방송이나 음반 녹음, 무대 공연을 위해 부르는 등 대중화되어 통속민요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음악적 특징 노랫가락의 음계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통속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솔(sol)-라(la)-도′(do′)-레′(re′)-미′(mi′)’ 5음 음계로, 그 중 솔(sol)은 종지음으로 사용하며, 선율에서 순차적인 음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음조직을 경토리 중에서도 진경토리, 또는 창부타령조라고 한다.

< 노랫가락 오선보 ©국립국악원 > 노랫가락은 다른 통속민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5박과 8박이 혼합된 형태의 장단으로 부른다. 통속민요로 부르는 노랫가락의 장단은 기본적으로 5·8·8·5·5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성이 세 번 반복되면 한 절이 완성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통속민요와 무가로 불리는 노랫가락의 경우에는 노랫말에 따라 혼합되는 박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3·8·8·5·5박 또는 8·5·8·5·5, 8·8·8·8 등의 다양한 구성이 무가에서 확인된다. 3박, 5박, 8박 등이 혼합되는 장단 구조는 시조에서 사용하는 장단의 구조와 유사하나 시조보다 빠르게 연주된다.

< 노랫가락 장단 악보 ©국립국악원 > ○ 가창형식과 창법 경토리(창부타령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노랫가락에서도 두드러지게 요성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창자에 따라 제4음에서 약한 요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제5음 mi는 더러 fa로 높여 부르기도 한다. 중장에서 유려한 고음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비성과 두성을 공명시키는 섬세한 발성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 노랫가락의 특징이다.
< 노랫가락 연주 영상 ©국립국악원 > ○ 형식과 구성 유절형식이지만 반복되는 후렴구가 없다. 각 절의 가사는 시조의 형식과 같이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이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창배(李昌培)의 『한국가창대계(韓國歌唱大系)』에만 100수 가량의 노랫말이 전하는 것을 볼 때 다양한 노랫말이 전하고 불리며 크게 유행했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노랫말이라 하여도 창자에 따라 선율 및 구성 박을 자유롭게 가창할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음악적 구사가 가능하다. 서울굿 음악의 반주형태인 삼현육각(대금, 해금, 피리2, 장구, 좌고)편성 또는 관현편성(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장구 등)으로 수성반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노랫말
1. 충신은 / 만조정이요 / 효자열녀는 / 가가재 / 라 / 화형제 / 낙처자하니 / 붕우유신 / 하오리 / 라 / 우리도 / 성주모시고 / 태평성대를 / 누리리 / 라 / 2. 무량수각 / 집을 짓고 / 만수무강 / 현판 달/ 아 / 삼신산 / 불로초를 / 여기저기 / 심어 놓/ 고 / 북당의 / 학발양친을 / 모시어다가 / 연년익/ 수 / 3. 공자님 / 심으신 남게 / 안연증자로 / 물을 주/ 어 / 자사로 / 뻗은 가지 / 맹자꽃이 / 피었도 / 다 / 아마도 / 그 꽃 이름은/ 천추만대에 / 무궁환/ 가 / 4. 산첩첩 / 천봉이로되 / 높고 낮음을 / 알건마 / 는 / 창해망망 / 만리로되 / 깊고 얕음을 / 알건마 / 는 / 사람의 / 조석변이야 / 알 길 없 / 네 / 1·3·4절: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 36쪽. 2절: 성음사, 『民謠三千里』, 성음사, 1968. 29쪽. -
참고문헌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이창배, 『한국가창대계(韓國歌唱大系)』, 홍인문화사, 1976. -
집필자
강효주(姜孝周)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