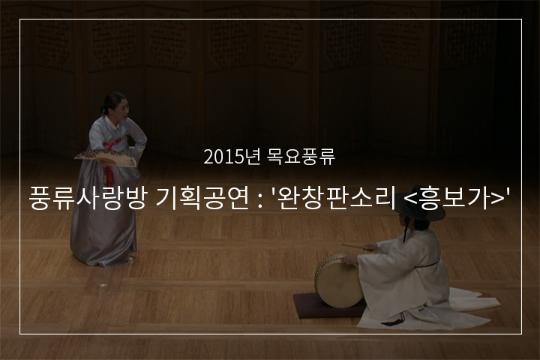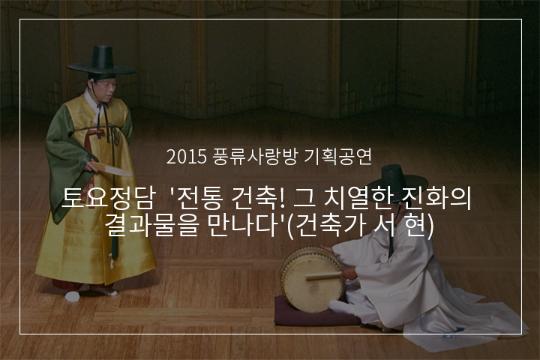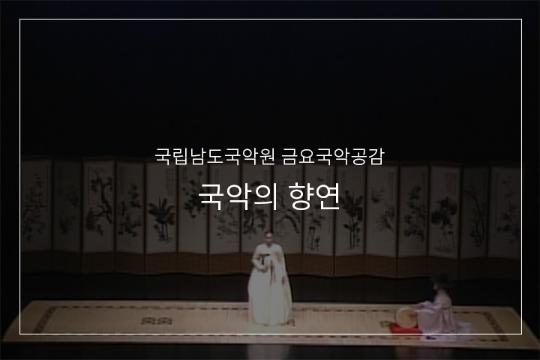-
다른 이름
도승이 내려오는데, 승타령
-
정의
-
요약
‘중타령’은 판소리, 무가, 탈춤, 어름, 잡가, 가사 등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가요이다. 판소리 《흥보가》와 《심청가》에 등장하는데 《흥보가》 중 중타령은 흥보에게 새로운 집터를 잡아줄 대사가 내려오는 대목이고, 《심청가》 중 중타령은 중이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주는 대목이다. 판소리에서 중타령은 고난이나 역경에 처한 인물을 구할 때에 비범한 인물인 중이 등장하는 대목으로, 엇모리장단단계면 선율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인물 묘사와 극의 새로운 전개를 암시한다.
-
유래
《흥보가》 중타령 대목은 《심청가》의 중타령과 같이, 뜻밖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분위기로 장면이 전환되고 사건의 극적 전개를 위한 인물로 등장한다. 판소리 중타령의 사설은 1870년 신재효 『신재효판소리사설집』 <심청가>와 <박타령>에 처음 나오는데 심청가 사설에는 중이 출현하기는 하지만 ‘중타령’이라 하기에는 사설 구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흥보가 중타령은 중의 치레 및 거동, 중의 염불, 흥보집 동냥, 집터 예언 사설로 비교적 길게 남아 있다. 중타령은 1912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구술, 이해조 정리의 〈강상련(江上蓮)〉과 1933년 이선유 『오가전집』의 《박타령》과 《심청가》에도 중타령이 나온다. 1940년 출판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는 중타령이 정창업(丁昌業, 1847~1919)의 더늠이며 이 대목은 《심청가》 중 몽운사 화주승이 권선시주를 얻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대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세기 전반에 《흥보가》 중타령 음반을 발매한 창자로는 서편제 명창 김창환(Regal C132-AㆍB), 오수암(Okeh 20091), 동편제 명창 김초향(KJ-1607), 박록주(Columbia 40447-A) 등이 있다. 《심청가》 중타령은 서편제 명창 정정렬(Polydol X605-A), 전일도, 동편제 명창 송만갑, 신금홍(RegalC284-B), 김녹주, 박록주(Columbia40172-B) 가야금병창 이소향(VictorKJ-1034-B) 등이 부른 여러 형태의 중타령 소리가 존재한다.
-
내용
중타령은 판소리 《흥보가》와 《심청가》에 등장한다. 판소리에서 중타령은 고난이나 역경에 처한 인물을 구할 때에 신비한 인물로 ‘중’을 등장시켜 장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극의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흥보가》의 중타령 전반부는 흥보에게 새로운 집터를 잡아줄 중이 내려오는 모습을 형용하는 사설로 중의 출현 및 중의 치레와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이며, 후반부는 중이 염불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흥보 집에 당도하는 부분이다. 《흥보가》와 《심청가》의 중타령은 같은 엇모리장단이고 중의 모양새와 거동묘사가 비슷하며 염불내용도 비슷하다. 둘 사이에는 분명히 교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쪽이 원조이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필사본 <심청전>연구에서는 중타령이 19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장면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창이 유행했던 판소리 연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판소리에서 엇모리장단은 3소박과 2소박이 섞인 혼소박 4박자 장단으로, 판소리에 비범한 인물이나 경개를 묘사하는 대목에 주로 사용된다. 한편 중의 신비한 모습과 비범한 인물을 표현하기에는 평우조의 악조가 보다 적절하나, ‘미(mi)-솔(sol)-라(la)-시(si)-도(do′)-레(re′)’ 구성음의 계면조로 선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중이 내려오는 장면과 중의 치레 및 거동 부분에는 도약 선율진행을 많이 사용하고 중의 염불소리는 메나리조가 조금씩 섞여 사용된다. 이 대목은 여느 계면조 대목과 달리 슬프거나 애처롭지 않고, 단계면 선율로 부름으로써 사설의 분위기에 적합하게 음악을 구사한다.
-
노랫말
《흥보가》중 동편제 《흥보가》를 이어받은 박송희 명창의 사설을 소개한다. “중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라는 노랫말로 시작하여 중의 치레 및 거동에 대한 형용과 염불 소리를 하고 흥보 집에 당도하는 사설 내용이다. [아니리] 이리 한참 말리고 울고 야단났을 적에 그 떼여 도승이 흥보를 살리려고 내려 오겄다. [엇머리] 중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 저 중의 거동을 보소. 헐디 헌 중 다 떨어진 송낙 요리 송 치고 저리 송치고 홈뻑 눌러쓰고 노닥 노닥 지은 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소상반죽 열 두 마디 용두새김 육환장(六環仗) 채고리 길게 달아 처절철 철철 흔들흔들 흐늘거리고 나려오며, 염불하고 나려온다. “아아 아허 허허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향래소수공덕해(向來所修功德海)요 회향삼천실원만(回向三千悉圓滿) 봉위 주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제연 세자전하 수천추 국태민안 법윤전 나무아미타불"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개 쿼겅컹 짖고 나니 "이 댁에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 최영란 창 동초제 《흥보가》 중 ‘중타령’ ©국립국악원 > -
의의 및 가치
판소리 ‘중타령’ 대목은 《흥보가》와 《심청가》중에서 극적으로 중요한 눈대목 중의 하나로서 엇모리장단에 단계면 선율을 사용한다. ‘중타령’ 대목은 《수궁가》의 ‘범내려온다’, 《적벽가》의 ‘한 장수 나온다’와 같이, 뜻밖의 신비스럽고 비범한 등장인물이 나올 때 장면이 전환되고 극의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양명희 창 《심청가》 중‘중타령’ ©국립국악원 >
-
지정사항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유산(1964)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03)
-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김태희, 「고음반에 수록된 ‘중타령’의 음악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헌선, 「중타령 연구」, 『판소리연구』 1, 판소리학회, 1989. 이선유 소리, 김택수 저, 『오가전집』, 대동인쇄소, 1933. 이보형,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엇모리가락 비교」, 『이혜구박사 송수 기념 음악학 논총』, 1969.
-
집필자
정수인(鄭琇仁)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